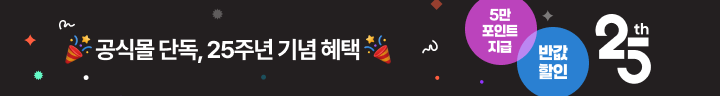그간 철석같이 믿어 왔던 표준 우주론. 믿음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다행히 천문학계에선 이미 표준 우주론의 궁극적인 정착지를 찾기 위해 ‘중력파’ 측정을 준비하고 있다. 중력파우주연구단 단장으로 한국 중력파 연구에 기여하고 있는 이형목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를 통해 그 노력을 들여다봤다.

우주론 검증할 새로운 눈 ‘중력파’
20세기 말 초신성, 우주배경복사 등 다양한 관측을 통해 ‘람다(Λ) 차가운 암흑물질 모형(LCDM)’은 무난히 주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모형이 대부분 그렇듯이 정밀한 관측이 거듭되면서 점차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암흑에너지분광장비(DESI)로 우주의 3차원 지도를 만드는 DESI 프로젝트의 최근 발표처럼, 이제 표준 우주론은 더 많은 관측을 통해 검증되거나 수정돼야 할 테다.
우주론의 가장 기본적인 관측은 ‘천체의 거리’와 ‘적색편이’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 것이다. 먼 은하들은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마치 후퇴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후퇴 속도에 따라 천체에서 오는 빛의 파장은 늘어나기 때문에 적색편이가 일어난다. 적색편이는 은하의 스펙트럼 관측으로부터 측정할 수 있고, 오차도 아주 작다. 반면 거리 측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측정 장치의 정밀도에서 비롯되는 계통 오차도 무시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천문학자들은 ‘표준 광원(밝기가 일정해 기준이 되는 빛)’인 여러 변광성으로 거리를 측정해 왔지만, 이들은 눈금 조정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계통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독립적인 거리 측정에는 ‘중력렌즈’나 ‘중력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중력파가 최근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중력파, ‘영점조절’ 없이도 거리 측정 가능해
중력파는 블랙홀처럼 무거운 천체가 움직이며 발생한 중력장의 흔들림이 빛의 속도로 진행하는 파동을 뜻한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상대성이론을 기반으로 1916년에 중력파의 존재를 예측한 바 있으나 실제로 직접적인 검출은 그로부터 거의 100년이 흐른 2015년 9월에야 이뤄졌다. 중력파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검출하는 일 또한 상당히 어려웠던 탓이다.
중력파는 빛의 속도로 전달되면서 시공간을 미세하게 변형시킨다. 다만 중력파가 만들어내는 시공간의 변화는 너무나 작아 측정하기 굉장히 까다롭다. 현재 가동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계획된 중력파 검출기는 대부분 ‘레이저 간섭계’ 원리에 바탕한다.
현재 가동되는 중력파 검출기는 미국의 라이고(LIGO·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2기, 유럽의 비르고(Virgo), 그리고 일본의 카그라(KAGRA)가 있다. 이들이 관측 가능한 중력파 주파수 대역은 50~1500Hz다.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구성된 밀집 쌍성은 중력파를 내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궁극적으로 충돌하는데, 지상검출기로는 마지막 수~수십 초 사이에 나오는 중력파를 관측할 수 있다.
라이고는 1990년대 초반에 건설을 시작해 2002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충분한 감도에 이르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흘러야 했다. ‘O1’이라 부르는 제 1차 관측 가동이 시작된 직후인 2015년 9월 14일 드디어 최초로 두 개의 블랙홀로부터 나오는 중력파를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관측으로 약 300건의 중력파 관측을 이뤘다. 이들은 대부분 블랙홀 쌍성에서 발생했다.
쌍성계의 중력파를 관측하면 천체의 거리를 알 수 있다. 중력파는 쌍성계의 질량, 회전, 그리고 궤도 이심률 등에 의해 파형이 결정된다. 파형은 거리와 무관하기 때문에 중력파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을 추정할 수 있다. 반면 관측되는 중력파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해서 줄어든다. 따라서 관측된 중력파의 파형으로부터 우선 쌍성계의 물리량을 도출한 뒤, 관측된 중력파의 세기를 추론해 거리 측정이 가능한 것이다. 마치 우리가 절대 밝기를 알고 있는 별을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일과 같은 원리다.

중력파의 단점 보완하는 ‘다중신호 천문학’
밝기를 알고 있는 별을 표준 광원이라 부르듯이 절대적인 중력파의 세기를 알 수 있는 중력파 파원을 ‘표준 사이렌’이라 부른다. 표준 광원과 달리 중력파를 통해 거리를 측정하면 눈금 조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밀집 쌍성계의 경우 일반상대론을 이용하면 정확한 파형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력파 관측은 적색편이를 측정하지 못한다. 블랙홀은 빛을 모조리 흡수하기 때문이다. 대신 중력파 천체도 다른 별들과 같이 하나의 은하에 속해 있으니, 중력파가 속해 있는 은하를 식별하고 해당 은하의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 적색편이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력파 검출기들은 지향 정밀도가 초라한 탓에 어느 방향으로부터 중력파가 오는지 특정해 내기 어렵다. 지금까지 알려진 중력파 파원의 대부분은 어느 은하에서 오는지 모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다중신호 천문학’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중신호 천문학은 전자기파, 중력파, 중성미자 등 서로 다른 신호가 전달하는 데이터를 조화롭게 관찰하고 해석하는 데 기반을 둔 천문학이다. 중력파는 여기서 점차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중력파 파원 중에서 중성자별 쌍성은 강한 전자기파를 만들어낸다. 중성자별이 충돌하는 순간 대부분의 질량은 블랙홀을 만들면서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지만, 바깥 부분에 있던 일부 물질은 블랙홀 주변을 도는 원반을 만든다. 이 원반의 수직 방향으로는 강한 제트(천체의 회전축을 따라 방출되는 물질의 흐름)를 내뿜으면서 감마선을 방출한다.
또한 뜨거운 원반에서는 중성자가 빠른 속도로 뭉치면서 무거운 원소로 합쳐진다. 원소들은 다시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며, 이때 발생하는 빛 때문에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킬로노바’로 관측된다. 이런 시나리오는 이론적으로만 예측됐으나, 2017년 8월 17일에 감마선과 중력파를 동시에 방출한 천체(GW170817)가 나타나며 반전을 일으켰다. 광학 망원경을 이용해 변광 천체를 발견함으로써 관측으로도 규명된 것이다. 이렇게 발견된 변광 천체의 모은하(host galaxy)는 중력파 측정을 통해 예상한 거리에 놓여, 중력파를 이용한 거리 측정의 신뢰도를 올려준다.
한국천문연구원과 서울대 연구팀은 변광 천체를 정밀 관측해 다중신호 천문학의 개막에 크게 기여했다. 이 천체를 이용해 허블 상수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력파를 이용해 측정한 거리의 정확도는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허블 갈등의 해소에는 이르지 못했다. 현재 중력파와 전자기파가 동시에 관측된 것은 GW170817이 유일하다.

우주 역사 개정을 위한 준비 ‘중력파 검출기’
중력파를 우주론 연구에 활용하는 과정에는 아직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나는 측정된 거리의 정밀도가 낮다는 점, 또 하나는 모은하 식별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모두 현재 중력파 검출기의 성능이 매우 한정적인 데서 나온다. 따라서 미래에 성능이 개선된 검출기를 통해 점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력파와 전자기파를 동시에 내는 다중신호 천체의 숫자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허블 상수의 통계적인 오차도 점차 줄어들 걸로 보인다.
앞으로 지금의 중력파 검출기보다 감도가 10배 정도 높은 3세대 검출기가 가동된다면, 중력파 파원의 검출 빈도수나 거리 정밀도는 현저하게 높아진다. 또한 0.1Hz 영역(데시헤르츠라 부른다)을 측정하는 중간 주파수 검출기가 우주에 함께 설치되면 밀집 쌍성계로부터 나오는 중력파를 최대 1년 동안 계속 관측할 수 있다. 중력파 파원에 대한 거리나 위치 정밀도는 그와 함께 매우 높아져, 전자기파 관측 없이도 모은하 동정이 직접 가능해질 수도 있다. 전자기파를 내지 않는 블랙홀 쌍성을 통해 정밀 우주론 연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데시헤르츠 영역의 중력파 검출기는 현재로선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인 개발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다만 앞서 말한 대로 가능성은 무궁하다. 우주론의 관점에서는 데시헤르츠 중력파 검출기가 완전히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 본다. 그때가 된다면, 우주 역사가 또 한 번 새로 써질 테다.
라이고(LIGO)로 중력파를 검출하는 과정


DESI 프로젝트부터 중력파 검출까지 조금씩 결과가 쌓이고 있습니다.
우주를 보는 시력이 밝아지는 셈이죠.
우주의 역사는 다시 쓰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