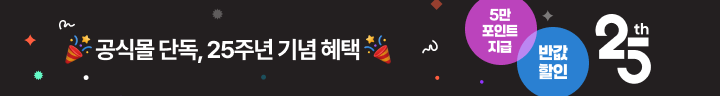광자를 활용한 양자 센서 원리

불확정성 원리로 결정되는 양자 센서의 정밀도
양자 센서는 양자 중첩이나 양자 얽힘과 같은 양자의 특성을 활용해 중력장, 자기장, 전기장 등의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이다. 양자 얽힘은 두 개 이상의 입자가 강하게 연결돼 있어,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입자를 관측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시 결정되는 현상이다. 센서에 여러 양자를 얽힌 상태로 만들어두면, 더 미세한 신호를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LIGO・라이고)가 있다. LIGO는 간섭계를 이용해 중력파를 검출하는 장비로, 2015년 사상 최초로 중력파를 탐지해 냈다. 이후 2019년에는 중력파 검출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양자역학적 특성을 지닌 빛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23년 10월 LIGO 연구팀은 관측 성능이 ‘표준 양자 한계’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고전 센서는 아무리 정밀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측정 도구는 본질적으로 측정 과정에서 노이즈를 생성하고, 측정 가능한 물리량들을 동시에 무한히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전 센서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정밀도의 한계를 표준 양자 한계라고 한다.
양자 기술의 발전은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양자역학 자체에서 기인하는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하이젠베르크 한계’라고 부른다. 이 이름은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인 ‘불확정성 원리’를 제안한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에서 유래했다.
불확정성 원리는 상보적인 두 물리량의 불확도를 곱한 값이 특정 값 이상이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하나의 불확도가 줄어들면 다른 하나의 불확도가 커지기 때문에 정밀한 동시 측정이 어렵다. 이로 인해 측정 정밀도에는 이론적 한계인 하이젠베르크 한계가 생긴다. 이런 하이젠베르크 한계에 가까이 도달할수록 센서의 성능은 뛰어나다고 본다. 양자 센서 연구자들의 목표는 바로 이 하이젠베르크 한계 극복이다.
임향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정보연구단 책임연구원이 이끄는 공동 연구팀은 2024년 1월 양자 현상을 이용해 하이젠베르크 한계에 도달한 ‘분산형 양자 센서’를 개발했다. doi: 10.1038/s41467-023-44204-z 분산형 양자 센서는 넓은 영역에 분산된 여러 개의 물리량을 기존의 고전 센서보다 높은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연구팀은 이 센서로 4개 공간에 존재하는 위상의 평균값을 동시에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드디어 양자 센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코앞에 다가온 것일까. 기자의 질문에 그는 단호히 “갈 길이 멀다”고 답했다. “앞으로 고전 센서를 대체해 양자 센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직 고전 센서와 비교했을 때 양자 센서가 실제 상황에서 우월성을 입증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양자 센서 vs 고전 센서, 정밀도 좌우하는 빛의 양
센서는 광자와 같은 입자를 이용해서 물리량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센서가 100개의 광자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자(n=100). 표준 양자 한계에서는 정밀도가 n분의 1에 비례한다. 즉 최대 정밀도는 10분의 1에 해당한다. 반면 하이젠베르크 한계에서는 정밀도가 n분의 1에 비례하므로 최대 정밀도는 100분의 1이 된다. 정밀도를 나타내는 숫자의 분모가 클수록 물리량을 더 촘촘하게 측정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하이젠베르크 한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양자 센서가 무조건 고전 센서보다 정밀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두 센서는 각각 이용할 수 있는 광자 개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빛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광자의 개수가 많으려면 빛의 세기가 커야 한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양자 센서에 쓰이는 얽힘 상태의 광자를 많이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양자 센서에 쓰이는 빛의 세기가 고전 센서보다 약하다. 김요셉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는 “광자 개수가 동일할 때, 양자 센서가 고전 센서보다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전 센서의 광자가 100만 개이고, 양자센서의 광자가 100개라면 압도적인 광자 수의 차이로 인해 n배만큼의 최대 정밀도 차이가 상쇄된다. 이런 이유로 임 책임연구원은 “양자 센서가 상용화되려면 양자광의 세기를 키우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자 센싱 한계


자기장, 온도다중 물리량 측정에선 한계가 깨질 수도?
여러 상태의 물리량을 측정할 때도 하이젠베르크 한계가 정밀도의 기준일까? 임 책임연구원이 속한 양자정보연구단은 분산형 양자 센서 외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 여러 개가 동시에 있을 때 불확도의 합을 최소화하는 양자 센서를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한 물리량 여러 개를 동시에 측정하거나 서로 다른 물리량을 동시에 측정할 때 정확도를 높이는 식이다. 여러 개의 물리량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해서는 양자 센싱에 사용하는 양자 얽힘 상태가 하나의 물리량을 측정할 때보다 더 커져야 하므로, 하나의 물리량만 측정하는 것과 비교해 훨씬 더 어렵다. 임 책임연구원이 이끄는 KIST 연구팀은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다중 물리량 측정에서 하이젠베르크 한계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doi: 10.1038/s41467-021-25451-4
다중 물리량을 측정하는 양자 센서도 하이젠베르크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할까. 임 책임연구원은 “다중 물리량 측정에서 하이젠베르크 한계가 진정한 최대 정밀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뜻밖의 답변을 내놓았다.
“입자가 3개 이상이 되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양자 얽힘 상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든 양자 얽힘 상태를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것이 많죠. 따라서 하이젠베르크 한계보다 더 높은 정밀도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어요.”

양자 센서 상용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양자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능력은 모든 양자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양자 센서의 진보는 양자 컴퓨팅과 양자 통신 등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양자 센서는 최근 몇 년간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며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양자 센서는 관성, 시간 측정, 자기장, 전기장, 광학 등 기존에 센서를 사용하던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양자 센서는 특히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 샘플을 다룰 때 빛의 세기가 너무 강하면 샘플이 손상될 수 있다”며 “동일한 약한 빛으로 측정할 때 양자 센서를 사용하면 정밀도가 높아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 책임연구원에게 양자 센서 기술이 향후 5년 내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물었다.
“양자 컴퓨터는 결국 하나의 승자가 나오겠지만 양자 센서는 종류가 워낙 다양해요. 물리량에 따라, 각 물리량 내에서도 그 대역에 따라서 정밀도가 높은 센서가 다릅니다. 단순히 ‘상용화가 됐다’와 ‘안 됐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발전 단계가 존재합니다. 아직 일상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엔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계속해서 상용화에 가깝게 나아가는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양자 센서는 자기장, 전기장, 광학 등 모든 측정 분야에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이끌 것이다. 이런 발전은 양자 컴퓨팅과 양자 통신을 가속화하는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