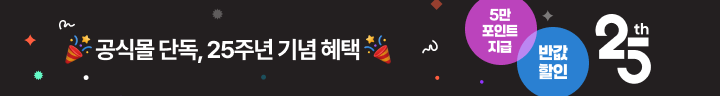영원히 변치않는 것처럼 보이는 별. 그러나 별은 인간의 생애처럼 탄생과 성장 그리고 죽음을 되풀이 한다. 영원한 것은 극적인 최후를 맞은 별이 다시 어린 별로 태어나는 윤회를 거듭한다는 사실.
은하계의 소용돌이 팔속에서 청백색의 어린 별들이 태어나고 있다.
밤하늘을 수놓는 수많은 별들.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제각기 다른 빛깔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푸른 별과 청백색으로 빛나는 별이 있는가 하면 노란 별과 붉은 별도 눈에 뛴다. 그러나 핼리혜성으로 우리에게 친숙해진 '우주의 방랑자' 혜성이나, 얼마전 대폭발을 일으켜 천문학자들의 밤잠을 빼앗아간 초신성을 관찰하려면 천체망원경이 필요하다.
우주의 거대한 드라마
망원경을 통해 본 천체는 한 편의 장대한 드라마를 엮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태양만한 질량을 가지면서도 지구정도의 크기밖에 안되는 백색왜성(白色倭星)이 있는 반면에, 만일 태양의 위치에 있다면 지구의 궤도까지 도달할만큼 커다란 거성(巨星)이 있다. 그밖에도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고 있는 구름처럼 신비롭게 빛나는 가스성운(星雲)과 폭발하고 있는 별들, 대폭발을 일으킨 잔해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더 깊은 천체의 비밀을 알아내려면 지구를 떠나야 한다. 지구대기의 방해가 없는 곳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X선으로 관측하면 보다 선명한 천체의 모습을 밝혀 낼 수 있다. 태양보다 무거우면서도 한라산만한 크기밖에 안되는 중성자성(中性子星)과 무한한 수축끝에 빛마저 삼켜버리는 블랙홀 등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모든 별들은 끝없이 진화하고 있다. '영원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긴 시간 동안이지만 별들은 탄생과 성장과 죽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거대한 드라마가 펼져치는 무대가 바로 우리 은하계이다.
우리의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약 2천억 개의 별들이 모인 별들의 대집단이다. 전체적인 모습은 가운데가 두툼하고 가장자리는 얇은 원반 모양으로 태양은 중심부에서 3만광년(빛의 속도로 3만년 걸리는 거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여름밤에 보는 은하수는 바로 이 은하계 원반의 한 단면이다.
18세기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암허셀'은 처음으로 태양이 은하계에 속하는 하나의 별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그는 태양이 은하계의 중심부에 있고 은하계 크기도 직경 7천광년 정도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밝혀진 우리 은하계의 직경은 약 10만 광년. 태양은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소용돌이 팔 가운데 하나에 자리잡고 있다.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곳이 바로 이 소용돌이 팔이다. 밤하늘을 관찰할 때 이곳에서 많이 발견되는 청백색으로 빛나는 별이 태어난지 얼마 안되는 젊은 별이다. 나이는 기껏해야 몇백만년정도. 따라서 별이 탄생하는 곳은 청백색의 별이 있는 주변이라고 보아도 좋다.

별 탄생의 요람 성간운
대표적인 예가 겨울밤에 볼수 있는 오리온자리. 여기에는 구름처럼 보이는 오리온 성운이라는 성간운(星間雲)이 있다. 이처럼 청백색 별의 집단에는 성간운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별은 성간운에서 탄생한다. 성간운은 태양 질량의 10만배나 큰 것도 많다. 이처럼 커다란 구름이 별의 질량 정도의 조그만 덩어리로 분열하여, 그것이 수축해 별이 되는 것이다.
성간운의 일부가 수축해 별이 만들어 질 때 반드시 하나의 독립된 별로만 되라는 법은 없다. 2개의 별(항성)이 서로의 주위를 도는 쌍동이 별이 될 수도 있으며, 1개의 별과 그것을 둘러싼 희박한 가스 구름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태양계가 만들어진 것은 나중의 방법을 통해서이다. 태양 주변의 가스 구름으로부터 행성 위성 등 태양계 가족이 만들어졌다.
보통 우리는 별과 별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상태라고 알기 쉽다. 그러나 지난 1951년경부터 본격화된 전파관측의 결과 매우 희박하긴 하지만 많은 양의 가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장 많은 것은 수소로 73%, 헬륨이 그 다음으로 25%이다. 성간가스의 밀도가 높은 암흑성운에서는 마그네슘 규소 철 등의 고체입자도 발견된다.
성간운에는 크고 작은 것 그리고 밀도가 높고 낮은 것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크기는 직경 30광년 정도이다. 비교적 밀도가 낮은 구름에는 1㎤당 약20개의 수소원자가 있다. 질량은 태양의 1천배 정도. 한편 밀도가 높은 성간운에는 ㎤당 1천개의 수소원자가 분포하는데 태양의 10만배의 질량을 가지며 분자운(分子雲)이라 불리운다. 성간운의 온도는 매우 낮아 저밀도 구름의 경우에는 50~1백50˚Κ(0˚Κ는 -273℃) 분자운은 10~30˚Κ이다.
성간운을 관찰하면 말머리 성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간가스가 뒷편의 별빛을 가려 검게 보이는 암흑성운이나, 가까이 있는 밝은 별빛을 반사해 희뿌옇게 보이는 산광성운(散光星雲)으로 보인다.
별이 태어나는 네가지 계기

성간운의 밀도가 비교적 높다고 하더라도 태양의 밀도는 이보다 ${10}^{18}$배나 높다. 따라서 태양과 같은 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성간가스가 무언가의 계기로 급격히 농축되고 그후 스스로의 중력으로 수축되어야 한다. 이처럼 별탄생의 방아쇠를 당기는 계기로는 네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우선 두 개의 성간가스가 충돌하는 경우이다. 이때 충돌의 접촉면은 압축되어 밀도가 높아진다. 어느 한계를 넘는 질량(임계질량)에 도달하면 성간운은 스스로 수축하여 별이 탄생한다.
강한 자외선을 내는 별도 새로운 별이 태어날 계기를 만든다. 즉 자외선이 주변 가스속의 원자에서 전자를 벗겨내 전리(電離)시켜 전리파면(電離波面) 을 만들어 낸다. 이 파면 바로 앞에 생기는 충돌파면에 성간가스가 통과하면 강하게 압축돼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밀도에 도달하게 된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은하계의 소용돌이 팔은 대표적인 별 탄생 장소이다. 그 이유는 뭘까? 성간가스는 별과 마찬가지로 은하계 중심 주변을 회전하고 있다. 그런데 소용돌이 팔에는 밀도의 고저에 따른 밀도파(密度波)가 발생해 이것이 회전하는 성간가스와 초고속으로 충돌해 충격파를 일으킨다. 이것이 암흑성운을 압박해 밀도를 높여 별을 만들어 낸다.
대폭발을 일으킨 초신성의 잔해도 새로운 별 탄생의 요람이 된다. 폭발로 인한 고온고압의 가스는 주변의 성간가스를 삼키면서 초음속의 속도로 팽창한다. 이때 성간운과 충돌하면 충격파가 생기고 고밀도의 농축이 일어나 별이 생길 여건이 마련된다. 황소자리의 게성운 등 초신성의 잔해에서 어린 별들이 발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임종을 맞은 하나의 별이 수많은 다른 별로 다시 태어나는 거대한 우주의 윤회현장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