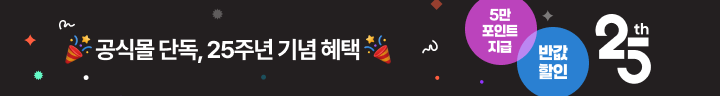넘어졌을 땐,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런데 달 탐사선의 경우엔 이야기가 다릅니다. 혼자 일어날 수 없잖아요. 3월, 미국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달 탐사선 ‘아테나’는 착륙 도중 넘어져 태양전지판으로 태양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하루 만에 작동을 멈췄죠. 소식을 들은 헝가리의 한 수학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해진 면으로만 서는 물체면 될 텐데?’ 7월 30일, 가보 도모코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기술경제대 교수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림이 아니라, 실물을 볼 때 받을 수 있는 인상은 차원이 다른 법입니다. 이번 사면체 연구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세요, 무척 아름답죠? 가늘고 긴 편이고요.”
7월 30일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가보 도모코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기술경제대 기하 모델링학과 교수가 검은색 프레임으로 이뤄진 물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물체는 그가 고안한 단일 안정 사면체 ‘빌레(Bille)’입니다. 도모코스 교수와 그의 제자 게르괴 알마디는 6월 24일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아카이브(arXiv)’에 ‘단일 안정 사면체 제작(Building a monostable tetrahedron)’이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doi: 10.48550/arXiv.2506.19244
도모코스 교수가 보여준 단일 안정 사면체는 안정적인 바닥면이 단 하나 있는 사면체입니다. 그 외 면은 바닥면으로 삼기에 안정적이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서 다른 면을 바닥으로 향하게 세우면 알아서 굴러 다시 안정적인 바닥면을 찾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정말 신기하니, 72쪽 하단의 QR 코드에 접속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예시를 들어 볼까요. 평범한 주사위를 떠올려 보세요. 주사위는 정육면체고, 여섯 개의 면 중 어느 한 면을 바닥으로 두더라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는 다중 안정 육면체입니다. 어떻게 던져도 숫자 6이 나오는 주사위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주사위는 단일 안정 육면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항상 같은 면이 바닥으로 가게 서니까요.
잼을 바른 식빵을 떨어뜨리면, 대부분 잼을 바른 면이 바닥에 닿는다고 하잖아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여겨지는 이 상황도 말하자면 빌레의 특성과 비슷하고요. 스니커즈를 던지면 대부분 신발 밑창이 바닥으로 가도록 떨어진다고 하죠.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잼 바른 식빵과 스니커즈는 (거의) 항상 같은 면을 바닥으로 가도록 서는 물체이니까요.
단일 안정 사면체 만들기,
60년간 난제로 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일 안정 사면체, 빌레는 언뜻 그냥 빨대와 두꺼운 종이로도 만들 수 있는 물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도모코스 교수는 “빌레의 구조를 찾고 제작하는 데에만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모코스 교수팀이 단일 안정 사면체를 찾는 문제에 뛰어든 세월만 고려한 겁니다. 수학계에서 단일 안정 사면체를 만드는 문제가 알려진 시기는 1966년이었으니 실제로는 60여 년 걸렸죠.
도모코스 교수에 의하면, 단일 안정 사면체 문제는 1966년 영국의 수학자 존 호턴 콘웨이와 리처드 가이가 응용수학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SIAM 리뷰’에 발표한 칼럼에서 처음 소개했습니다. 당시 콘웨이와 가이는 독자들에게 “어떤 모양이든, (밀도가) 균질한 사면체는 최소 두 면에서 중력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달라”는 모종의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같은 재료로 이뤄져, 전체적으로 균일한 밀도를 가진 사면체의 경우 밑면으로 삼기에 안정적인 면이 최소 두 개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 외 면을 밑면으로 삼으면 사면체가 굴러서 안정적인 면을 찾죠.
오늘날 K팝 아이돌들이 신곡 안무를 따라한 다음, 영상을 찍어 올려 달라는 ‘챌린지’를 많이들 하잖아요? 60년 전 수학자들이 하던 일도 상당 부분 유사했습니다. 콘웨이와 가이가 ‘최소 두 면에서 중력적으로 안정적인 균질한 사면체 찾기’ 챌린지를 시작하고 1년 뒤, A. 헵스라는 이름의 수학자가 같은 학술지에 “두 개의 모서리를 거치며 구른 다음 안정적인 면을 찾아 완전히 정지하는 균질한 사면체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1984년 콘웨이는 동료에게 “단 하나의 밑면에서만 안정적으로 멈추는 균질하지 않은 사면체는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균질하지 않은 사면체란, 밀도의 분포가 부분에 따라 달라지는 물체를 말합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단일 안정 사면체는, 그 재료와 모양, 그리고 설계를 잘 하면 구현이 가능한 물체였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잘’ 만들어야 하는지였죠. 콘웨이는 이론을 다루는 수학자였습니다. 어떤 물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고 나면 그의 일은 끝나는 셈이죠. 한편 도모코스 교수는 수학과 공학을 결합하는 데 관심이 많은 수학자입니다. 이론 속에만 존재하는 단일 안정 사면체를 현실로 끌어내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도모코스 교수의 일은 ‘단일 안정 사면체는 존재한다’는 콘웨이의 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단일 안정 사면체를 구현하는 건 그간 많은 수학자들이 실패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납과 가늘게 쪼갠 대나무로 단일 안정 사면체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이 모델은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납의 무게 때문에 대나무로 만든 모서리가 휘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모서리를 구부리는 것은 규칙을 구부리는 것과 같다. 곡선 모서리를 사용할 수 있다면, 단일 안정 사면체를 만드는 것은 매우 쉽다. 곡선 모서리로 이뤄진 사면체는 구와 유사하다. 구를 떠올려 보라. 만일 구의 질량 중심이 구의 (기하학적) 중심과 동일하지 않다면 구는 단일 안정적일 것이다.”
만드는 과정에서 모서리가 구부러진다면 그냥 나뭇가지로 오뚜기를 만든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오뚜기는 아래 부분의 밀도를 높여 질량 중심이 기하학적 중심과 동일하지 않도록 만들잖아요. 그리고 동글동글하니 쉽게 구르고요.
도모코스 교수는 인터뷰에서 “단일 안정 입체도형을 찾는 문제는 면의 수가 적을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단일 안정 입체도형이라면, 안정적인 바닥면 외에 다른 면을 아래로 하게 세워 뒀을 때 알아서 굴러 안정적인 바닥면을 찾아야 해요. 이십면체로 이런 입체도형을 만든다면 문제가 쉽습니다. 면과 면이 만나 생기는 모서리가 대부분 둔각을 이루잖아요? 잘 구르겠죠, 도르르.
그런데 사면체의 경우 면과 면이 만나 생기는 모서리가 대부분 90도보다 작은 예각을 이룹니다. 그런 물체가 알아서 구른다는 게 상상이 잘 안 가죠. 책상 위에 내려놓은 삼각 커피우유가 갑자기 알아서 구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일어나는 물체, 빌레의 구조

준비물:
텅스텐 카바이드와 탄소 섬유 튜브, 그리고 초정밀 제작 기술
사실, 기자는 도모코스 교수와 인터뷰를 한 다음 빌레를 직접 만들어 볼 생각이었습니다. 도모코스 교수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음… 우리가 빌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해줄 테니 직접 결정해 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도모코스 교수는 논문에 빌레의 각 모서리의 길이 정보를 다 적어 놨어요. 3차원 좌표로 적어 놔서, 길이를 알기 위해선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뭐 문제가 있겠나 싶었죠(독자 여러분을 위해 제가 대신 길이를 계산해 놨어요.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도전정신이 투철한 분이라면 빌레 만들기에 도전해 보시기).
“컴퓨터 모델링을 이용해 가능한 단일 안정 사면체의 형태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단일 안정 사면체 형태를 무척 많이 찾았는데, 논문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발견은 아니었거든요. 그것보다 수만 배 더 재미있는 문제는 이걸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찾아낸 형태 중에서 그나마 가장 구현할 만한 걸 찾고, 그걸 만들 재료를 찾기 시작했죠.”
도모코스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렇게 찾은 재료가 텅스텐 카바이드와 탄소 섬유 튜브였습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은 밀도가 1.36g/cm3인 탄소 섬유 튜브로 만들었습니다. 가볍죠. 그리고 바닥면 일부 부분에는 밀도가 14.15g/cm3인 텅스텐 카바이드 판을 붙였고요. 도모코스 교수는 “탄소 섬유 튜브로 만든 프레임으로 이뤄진 큰 공간의 밀도와 텅스텐 카바이드 판의 밀도 차이가 약 5000배 이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밀도 차이가 이 정도는 돼야, 단일 안정 사면체를 만들 수 있죠.
1:5000이 그나마 구현하기 쉬운 밀도 비율이고요, 도모코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태양의 중심보다 더 밀도가 높은 물질을 이용해야 밀도 비율을 구현할 수 있는 단일 안정 사면체도 있다고 합니다. 기자는 이 대목에서 “허억”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도모코스 교수의 대답을 듣고 깔끔히 포기했어요.
“빌레를 만들 때 초정밀가공기술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오차범위가 0.1mm 정도였죠. 제작자에게 제 돈 3500유로(9월 10일 기준 약 570만 원)를 주고 직접 만들었어요. 저는 부다페스트에서 삽니다. 제 월급이 얼마나 짤지 생각해보세요. 거금을 들여 완성된 빌레를 처음 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빌레는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제작자에게 물었습니다. 설계도대로 했나요? 네. 정확히 만들었나요? 네. 재료도 제대로 썼고요? 네.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죠. 그런데 제작자가 한 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여기 모서리에 접착제가 좀 뭉친 곳이 있긴 한데, 이 정도는 문제없을 거예요.’ 뭐, 1mm 이하의 작은 덩어리였어요. 그래도 거금을 들여 만드는 거니 그 부분도 떼 달라고 부탁했죠. 아니나 다를까, 접착제 덩어리를 떼고 나니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 즉시 제자 게르괴에게 전화했죠. 그는 그때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다가 전화를 받고는 제 자리에서 점프했다고 하더라고요.”

수학적 발견이 자연의 모습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곰복’에서 ‘빌레’까지,
이상한 물체의 절묘한 쓸모를 찾아서
도모코스 교수의 연구 인생은 내내 빌레와 같이 묘한 균형을 이루는 물체를 탐구하는 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2006년 존재를 입증한 ‘곰복(Gömböc)’이란 물체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러시아 수학자 블라디미르 아놀드의 1995년 제안을 도모코스 교수가 실물을 만들어 검증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름을 붙였죠. 곰복도 빌레와 유사하게, 밀어도 쓰러지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오뚜기는 아래에 무거운 물질을 채워, 스스로 일어나는 성질을 갖추는데요. 곰복의 경우 내부의 밀도가 균일하다는 게 특징이죠. 곰복 연구는 수학동아 2013년 8월 표지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 섭외 메일을 보내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도모코스 교수가 “이전 연구를 크게 다뤄줘 고마웠다”고 말했죠.
곰복이나 빌레처럼 언제나 똑바로 서는 물체에는 의외의 쓸모가 많이 있습니다. 곰복의 경우 2019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 공동연구팀이 인슐린 캡슐을 디자인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이 캡슐 하단 부분에는 인슐린을 주사할 작은 바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이 울퉁불퉁한 위장 속에서도 똑바로 서서, 바늘이 위장 벽에 닿는 게 중요했죠. 스스로 일어나는 성질을 가진 곰복을 적재적소에 이용한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doi: 10.1126/science.aau2277
빌레는 앞으로 달 탐사선 개발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2024년 1월, 일본의 무인 달 탐사선 ‘슬림(SLIM)’은 착륙하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 결과 태양전지판의 위치가 햇빛의 반대편을 바라보게 돼 전력을 생산하지 못했죠.
2025년 3월엔 미국의 뉴스페이스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쏘아 보낸 무인 달 탐사선 ‘아테나(Athena)’가 넘어지면서,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2024년 무인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Odysseus)’가 달에서 넘어진 이후로 두 번째 실패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빌레는 자꾸만 넘어지는 달 탐사선에게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도모코스 교수는 “달 탐사선은 다리와 안테나가 튀어나와 있어서, 넘어지기 쉽다”면서 “현재 개발된 달 탐사선은 어떤 면으로 서도 안정적이므로, 넘어지면 그대로 멈춰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넘어진 상태가 안정적이라 그대로 멈춰 있는 거라면, 넘어진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빌레처럼, 안정된 면의 수를 줄이기만 해도 착륙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겁니다. 현재 독일의 미세 중력 연구팀과 협업을 논의하고 있고, 유럽우주국(ESA)도 우리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과학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가 발표될 때는 그 쓸모를 모를 수도 있어요. 위대한 수학자였던 베른하르트 리만이 논문을 발표했을 때, 당시 사람들 누구도 그 논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150여 년이 지난 지금 보세요, 리만의 연구 결과는 초전도 물질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다양한 곳에 쓰이죠. 그래서 과학에는 인내와 호기심이 필요한 겁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우주 탐사선을 개발하는 일은 우주 탐사에서 중요한 해결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