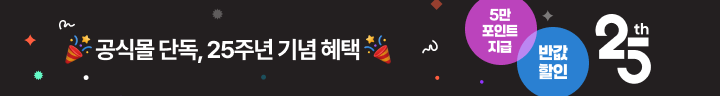도대체 왜 이 인형에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걸까. ‘나는 절대 사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태국 여행에서 그 생각은 흔들렸다. 팝마트가 입점한 대형 쇼핑몰 주변부터 커다란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눈에 띄었고, 궁금증에 들어선 매장에는 이미 긴 대기줄이 늘어서 있었다. 어렵사리 다다른 라부부 진열대에서는 또 다른 경쟁이 한창이었다. 6개들이 박스는 진열되는 족족 팔려나갔고, 대부분의 제품에는 품절 라벨이 붙어 있었다. 남은 상품도 금세 동이 났다. 사람들은 전시된 라부부 피규어를 사진으로 남기고 환호하며 열기를 만끽했고, 어느새 나도 계산대를 향한 긴 줄 끝에 서 있었다.

‘예쁜 척’을 거부한다, 어글리 큐트
전 세계가 ‘못생긴 귀여움’에 사로잡혔다. 이 역설적인 표현의 주인공 라부부는 2015년 홍콩의 일러스트레이터인 카싱 룽이 처음 창작한 캐릭터로, 중국의 캐릭터·완구 기업 팝마트가 상품화시켰다.
라부부는 2023년 플러시 펜던트 시리즈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태국, 한국, 유럽까지 확산됐고, SNS엔 셀럽들의 개봉 인증샷이 줄을 이었다. 재판매(리셀) 가격도 나날이 폭등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못생김마저 상품이 되는 시대, 라부부는 기괴한 귀여움과 불확실한 보상, 온라인 인증 문화가 결합한 새로운 소비 공식을 상징한다. 이 새로운 공식은 지금의 열풍을 넘어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삐죽삐죽한 이빨, 매끈한 얼굴에 복슬복슬한 털, 선과 악이 동시에 담긴 표정. 처음엔 이 못생긴 인형에 왜 모두 열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볼수록 시선을 붙잡더니, 결국 서서히 빠져들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어글리 큐트(ugly-cute)’다. 기괴함과 귀여움이 충돌하는 경계에서 탄생하는 매력이다. 라부부가 증명한 어글리 큐트의 위력은 퉁퉁한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맺힌 크라이베이비, 창백한 피부에 털옷을 걸친 스컬판다, 우주복 속 천진한 표정의 몰리 같은 팝마트의 다른 캐릭터로 확장 중이다. ‘예쁜 척’을 거부하는 기묘한 분위기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심리학에선 이와 유사한 효과들이 오래전부터 보고됐다. 진화심리학의 아기 얼굴 효과(baby schema effect)는 아기의 둥근 얼굴과 큰 눈이 보호 본능을 자극한다는, 귀여움의 보편적 원리를 보여준다. 사회심리학의 프랫폴(Pratfall) 효과는 2% 부족한 결함이나 어색함이 친근감으로 반전되는 효과를 설명한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할 때 호감도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이다. 물론 라부부처럼 기괴함이 결합한 매력까지 이해하려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최근 한 심리학 연구에선 사람들이 ‘못생김 속의 귀여움’을 대할 때,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으로 확인했다. 참가자들은 어글리 큐트 이미지와 전형적으로 귀여운 이미지를 함께 보고 매력도와 정서적 반응을 평가했다. 어글리 큐트 이미지는 첫 인상에선 낯설고 불편하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이미지가 반복 노출될수록 친근감과 호감도가 점점 뚜렷하게 높아졌다. doi: 10.3389/fpsyg.2024.1340552

연구자들은 이를 인지적 반전 효과로 설명한다. 처음엔 낯선 이미지를 향한 놀람과 당혹감이 앞서지만, 반복해서 접하면 첫 인상이 웃음과 재미로 반전되며 점차 익숙해진다. 이 웃음이 친근감으로 이어지고 사람들의 기억에 더 깊이 각인되는 매력을 형성한다.
이런 매력은 뇌가 새로움과 친숙함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방식과 닿아 있다. 귀여울 줄 알았는데 못생겼고, 못생겼는데 귀여운 대상을 접하면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며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 경험이 반복될수록 애착은 점점 강화된다. 보상 회로의 반응은 매력도에 단순히 비례하지 않으며, 매력적인 얼굴뿐 아니라 못생기거나 불편한 얼굴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가 있다. doi: 10.1080/17470911003619916

예측 불허의 쾌감, 블라인드 박스
내가 이번에 여행한 태국은 라부부를 판매하는 팝마트가 본국인 중국에 이어서 각별히 공을 들이는 해외 시장 중 하나다. 방콕 시내 곳곳에 대형 팝마트가 입점해서 라부부 같은 인기 제품을 한국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 물론 그마저도 긴 기다림과 눈앞에서 동날 위기를 감수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정품 라부부 박스를 손에 쥐자 잠시 흥분이 밀려왔다. 많은 사람이 속아서 가품 라부부를 샀다는 이야기가 떠올랐고, 그 순간 정품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희소성을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것이 곧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신호로 작동했다. 라부부를 통해, 심리학에서 말하는 희소성 효과를 직접 체험한 셈이다.
라부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심장 박동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은 블라인드 박스 방식이다. 박스 내부가 보이지 않아 어떤 색의 모델이 들어 있는지 모른 채 구입해야 한다. 이 방식은 일명 ‘뽑기’라 불리는 일본의 가챠폰 문화에서 유래했으며, 원하는 디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긴장과 기대를 키운다. 라부부 열풍은 바로 이 불확실성에 ‘어글리 큐트’의 정서적 반전이 겹치며 증폭된 결과다.
특히 ‘시크릿 에디션’에 대한 기대감은 상자를 열자마자 ‘하나 더?’라는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충동구매 욕구가 강해진다는 연구도 있다. doi: 10.3389/fnbeh.2022.946337 흥미로운 점은 자신을 ‘운이 좋다’고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충동구매를 일으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을 놀이처럼 즐기는 태도는 키덜트를 포함한 Z세대에서 두드러진다.
여기에 SNS와 커뮤니티 문화가 더해지면서 라부부 현상은 한층 확대된다. 소유 자체보다 언박싱의 짜릿함과 그 과정을 공유하는 즐거움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그 결과 블라인드 박스는 개인적 소비를 넘어 공동체적 게임으로 확장되고, 라부부와 같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와 재구매 의향은 더욱 강화된다.
하지만 원치 않는 게임에 휘말리기도 한다. SNS는 비슷한 시리즈를 끊임없이 노출하고, 추천 알고리즘은 다른 색상, 다른 표정의 라부부를 권한다. ‘다 모아야 완성된다’는 수집욕까지 겹치면 손가락은 이미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다. 도파민이 폭발하는 순간이 지나 박스를 열고 나면 괜히 샀다는 후회가 곧바로 찾아온다. 짧은 즐거움 뒤에 밀려오는 허탈감, 누구나 경험해본 바로 그 감정이다. doi: 10.21203/rs.3.rs-5353669/v1

소외감을 매개로 확산되는 열광과 피로감
이런 라부부 경험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SNS엔 “처음엔 관심 없었는데, 결국 빠져들었다”는 경험담이 끝없이 이어지고, 라부부 언박싱이 해시태그와 알고리즘을 탈 때마다 “나만 못 샀어”란 글들이 쏟아진다. ‘소외될까 두려운 마음’(FOMO·Fear Of Missing Out)이 작동하는 것이다.
문제는 FOMO가 단순한 불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FOMO가 높을수록 SNS 피로도도 높아진다. FOMO가 SNS 사용을 자극하고, 이 사용이 다시 FOMO를 키우는 순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라부부 언박싱 인증이 이어지는 환경은 이 악순환을 강화하며, 열광과 피로를 동시에 키우는 양가적 경험으로 치닫는다. doi: 10.1177/14614448241235935
라부부 이후의 소비 메커니즘을 묻다
라부부는 어글리 큐트라는 낯설고도 매혹적인 미학으로 전 세계 소비자를 사로잡았다. 여기에 블라인드 박스 같은 검증된 공식이 더해져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팝마트의 2025년 상반기 매출은 2024년 상반기 대비 204% 증가했고, 순이익은 네 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라부부가 속한 ‘더 몬스터즈’ 시리즈 매출이 48억 위안(약 9400억 원)에 달해 전체 매출의 34.7%를 차지했다. ‘중국산’ 장난감으로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 중국이 라부부로 한국의 K팝이나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대응하는 소프트파워를 구축 중인 현상은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욕망으로 이어진다. 그 지점에서 다시 묻게 된다. 우리는 왜 귀여움에 끌리는가. 예쁨과 못생김, 낯섦과 친숙함, 내적 욕망과 외적 과시가 교차하는 자리에서 라부부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작동한다.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은 앞으로도 다른 캐릭터와 상품으로 변주될 것이다. 라부부 이후를 이해한다는 건 어떻게 우리의 욕망이 설계되고, 또 어떻게 소비로 소진되는지 돌아보는 일이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