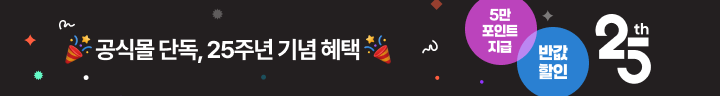‘화성에서 생명체 흔적 발견!’ 이런 과학기사를 보면 괜히 클릭하고 싶지 않으세요?
주변을 보면 과학 좋아하는 친구, 가족, 동료 한두 명쯤은 꼭 있지 않나요?
‘과학이 내 삶에 도움이 된다’ 혹은 ‘이공계 진로도 괜찮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마 “내 얘긴데?” 싶으셨을 거예요. 유튜브와 SNS, 이제는 AI까지 재미를 주는 세상에서, 과학동아를 읽는 독자라면 정체성 속에 과학이 자연스레 스며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테니까요. 꼭 ‘뼛속까지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이처럼 개인의 과학 정체성을 쌓아가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과학자본’입니다. 지식, 경험, 태도, 관계 같은 과학과 연결된 모든 것들의 총합.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루이스 아처 교수가 이름 붙인 개념입니다.
본래 사회 비판적 맥락에서 논의된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자본’ ‘문화자본’ 개념을 과학대중화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개념으로 새롭게 풀어냈습니다.
사회자본은 ‘누구를 아느냐’, 문화자본은 ‘어떤 태도와 소양을 지녔느냐’에서 힘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격식 있는 자리에서 테이블 매너를 아느냐 모르느냐 같은 차이가 자산이 되죠. 이런 자본은 대체로 희소할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나아가 경제적 자본으로 교환될 가능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특정 명문대 출신이 인맥 덕분에 좋은 일자리를 얻거나, 교양과 취향이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지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본은 어떨까요? 과학자본은 ‘과학을 얼마나 가까이 두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자본들과 닮은 점도, 다른 점도 있죠. 통계적으로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과학자본도 높게 나타난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본은 누군가가 더 가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덜 가지게 되는 성격은 아닙니다. 또 과학자본은 혼자 쌓는 힘이 아닙니다. 사회가 과학자본을 인정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힘이 됩니다.
창간 40주년을 앞둔 과학동아가 지금 이 개념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우리가 해온 일은 결국 독자들의 과학자본을 차곡차곡 쌓는 일이었고, 앞으로 가장 잘하고 싶은 일도 역시 그 일입니다. 독자 한 분 한 분이 과학자본을 바탕으로 꿈을 키우고, 그것이 모여 사회가 더 단단해지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번 달부터 특별 연재를 시작합니다. 첫 글은 과학자본 개념이 태동한 영국 현지를 직접 찾아가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한국의 과학자본은 어떻게 쌓여왔는지, 지금 우리의 수준은 어디쯤인지, 또 AI 시대에 과학자본을 어떻게 더 빛나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차근차근 짚어볼 예정입니다.
과학을 정체성으로 지닌 독자 여러분이라면, 이번 연재가 그야말로 “내 얘기”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40년의 레거시 위에서 다시 그려나갈 새로운 40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