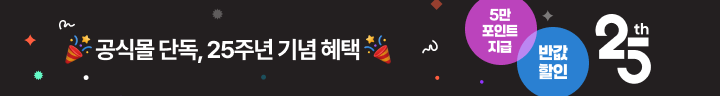이 부품이 없다면 F1 레이스카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바로 파워유닛이다. 파워유닛의 더 익숙한 이름은 바로 엔진. F1의 ‘전성기’를 이끈 장본인이자 탄소중립의 시대 F1의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2025년 6월, 포뮬러 1(F1)을 소재로 한 영화 ‘F1® 더 무비’가 개봉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영화 주인공 ‘소니 헤이스(브래드 피트)’는 1990년대 초 F1에 데뷔해 큰 주목을 받았지만, 불의의 사고로 F1을 떠난다. 그리고 2023년, 다시 F1으로 돌아온다. 영화에서는 주목하지 않지만, 헤이스가 2023년 탄 레이스카는 1990년대 초 레이스카와 완전히 다른 차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엔진에 있다.

1990, F1에도 전성기가 있다
1990년대는 F1의 전성기라 불린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진 F1의 엔진 실험이 1990년대 꽃을 피웠기 때문이다. 1990년대 페라리는 V12 엔진의 대명사로 꼽혔다. V12는 12개의 실린더가 엔진 내부에 알파벳 ‘V’ 모양으로 배치됐음을 뜻한다. 실린더는 피스톤이 움직이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핵심 공간이다. V형 배치는 부피를 줄일 수 있고 엔진의 무게중심을 낮춰 운전하기 유리하다. F1을 비롯해 여러 모터스포츠 레이스카에서 많이 사용된다.
V12 엔진은 1940년대부터 꾸준히 개발돼 F1 레이스카에도 장착돼 왔지만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져 경기 중 엔진이 터지거나, 차량이 멈추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1990년대 V12는 달랐다. 최고 회전수 1만 7000rpm에 가까운 고회전과 최고 출력 800마력 이상의 고성능 부품이었다. 게다가 작고, 가볍고, 내구성까지 갖췄다.
모든 팀의 엔진 내 실린더의 수가 12개였던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는 V8부터 V12까지의 엔진이 동시에 트랙 위를 달렸다. 1994년 페라리는 V12 엔진을 사용한 반면 베네통은 포드-코스워스가 만든 V8 엔진을 장착했다. 윌리엄스는 르노가 만든, 맥라렌은 푸조가 만든 V10 엔진을 썼다. V12 엔진은 최고 출력은 높지만 무겁고 연료 소비가 많은 편이었다. 페라리 레이스카는 울부짖는 듯한 배기음을 내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베네통은 날카롭게 코너를 돌았다. V8 엔진의 출력은 다른 팀들에 비해 낮았지만 가볍고 연비가 좋았다. V10은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균형이 좋았다. 엔진의 차이는 차량의 무게 중심, 길이, 냉각 시스템, 연료탱크 용량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 각 팀은 각자의 차량 설계 철학을 추구하며 우승을 노렸다. 2000년도부터는 실린더 개수에 규제 및 제작 기준이 생겼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V10,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V8 엔진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F1 레이스카의 심장, 하이브리드 V6 터보 파워유닛
2025년 포뮬러1(F1)에서는 하이브리드 V6 터보 파워유닛을 사용하고 있다. 파워유닛은 총 6개 부품으로 구성된다. 2014년 출시된 1.6L V6 내연기관을 비롯해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장치, 재활용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제어하는 배터리, 제어 장치 등이다. 파워유닛은 빠른 속도와 극한의 열효율, 경량화 등 F1의 최대 성능을 위해 설계됐다.
F1 레이스카와 슈퍼카 비교

F1 파워유닛 구성

전자 제어 장치(CE)
F1 파워유닛의 두뇌. 에너지 흐름 등을 관리하는 제어 장치다.

에너지 스토어(ES)
리튬 이온 배터리 팩. MGU-K와 MGU-H가 회수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에너지를 공급해 차량 가속을 돕는 고성능 전력 저장 장치다.
터보 차저
배기 파이프와 연결된 엔진 출력 강화 장치. 엔진은 공기와 연료가 섞여야 작동하는데 일반적인 자연흡기 엔진은 공기를 충분히 빨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배기 가스의 힘으로 공기를 더 많이 집어넣어 엔진 출력을 올린다.
열 에너지 회수 장치(MGU-H)
F1에만 사용하는 기술로 배기열 에너지를 최종 전기로 바꾸는 장치. 터보 차저 근처, 뜨거운 배기 가스가 나올 때 발생하는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거나 MGU-K 또는 에너지 스토어(ES)에 전달하는 시스템. 다만 2025년까지만 사용되며 2026년부터 폐지된다.

운동 에너지 회수 장치(MGU-K)
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배터리에 저장해 뒀다가, 차량이 가속할 때 전기 모터로 출력을 보태 주는 시스템. 감속하거나 가속할 때 작동한다.
내연기관(ICE)
자동차 동력을 생산하는 1.6L V6 터보 엔진. 6개 실린더가 V자 형태로 배치돼 있다. 6개 실린더의 총 배기량이 1.6L(1600cc)다. 내연기관 실린더 수는 1970~1990년대 12개까지 늘어났으나 현재 세계자동차연맹(FIA)이 레이스카 출력과 무게, 효율, 팀 간 격차 등을 고려해 제한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시대, F1에 도입된 파워유닛
2014년, F1은 거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하이브리드 시대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는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원을 함께 사용해 동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의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F1을 주관하는 세계자동차협회(FIA)는 “F1이 연료 소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차량을 설계해야 한다”며 규정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함께 F1에서는 파워유닛(PU· Power Unit)이란 용어가 도입됐다. 연료를 연소시켜 동력을 만드는 엔진만으로는 F1 레이스카의 동력원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파워유닛은 F1 차량의 동력 시스템 핵심이다. 파워유닛은 총 6개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내연기관의 엔진을 비롯해 배터리, 터보차저, 전자 제어장치, 열에너지 재생 장치(MGU-H), 운동에너지 재생 장치(MGU-K)다. 이들 장치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최대 1000마력의 출력을 만들어낸다. 이는 일반 자동차의 5~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14년부터 현재(2025년)까지 F1은 1.6L V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6L는 엔진 실린더의 배기량이다. 6개의 실린더가 움직이면서 공기를 흡입하고, 연소하고, 배기하는 공간의 크기다. 실린더 하나당 약 0.266L다.
파워유닛이 도입되면서 F1에서 전략의 핵심은 배터리 관리(ERS·Energy Recovery System)가 됐다. 파워유닛은 MGU-H와 MGU-K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회수하고 저장할 수 있다. F1 레이스카는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는 배터리를 절약하거나 저장하고, 직선 구간에서 추월하거나 추월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저장해 놓은 전기를 이용해 약 160마력의 출력을 높인다.
F1 레이스카 뒤쪽에 있는 빨간 LED 라이트는 단순한 브레이크 등이 아니다. 비가 오는 날은 뒷 차량의 시야 확보를 위해 켜지만, 맑은 날에는 레이스카가 에너지 회수를 하고 있을 때 깜박인다. 이를 ‘하베스팅(Harvesting)’이라고 부른다. 주행 중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 배터리에 저장하는 것이다. 즉 깜박이는 빨간 신호로 ‘배터리 관리를 하는 중’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F1 레이스카가 서킷을 한 바퀴 돌 때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은 약 4MJ(메가 줄·1MJ은 100만 J)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엔진
엔진 개발의 다양성은 역사가 됐지만 파워유닛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파워유닛도 성능 차이가 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된 메르세데스의 V6 하이브리드 엔진은 F1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엔진(파워유닛) 중 하나로 꼽힌다. 메르세데스는 2014년부터 하이브리드 시스템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2007년 곧바로 파워유닛 연구개발(R&D)팀을 꾸렸다. 이 덕분에 메르세데스는 경쟁사보다 2~3년이나 빠르게 파워유닛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수 있었고, 2014년 도입 시점에는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했다.
무엇보다 메르세데스의 V6 하이브리드 엔진은 MGU-H 기술 구현에서 다른 파워유닛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다. MGU-H는 발전기이자 모터 역할을 하는 장치다. 우선 MGU-H는 기존에는 그냥 날려버렸던 터보 배기열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바꾼 뒤 전기로 회수한다. 배기가스로 터빈을 고속 회전시키고, 그 에너지를 전기로 회수해 배터리에 저장하거나 MGU-K로 전달해 가속을 보조하는 것이다. 레이스카가 순간 강한 힘으로 가속을 할 수 있게 도와 주기도 한다. 레이스카는 코너에서 느린 속도로 주행할 때 터빈의 회전이 같이 느려진다. 이 때문에 코너에서 빠르게 빠져나와야 할 때 터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가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MGU-H는 전기를 사용해 터빈의 회전력을 높인다.
메르세데스의 MGU-H는 가속이 지연되는 현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력 전환이 부드러웠고, 고속에서도 출력을 유지했다. 당시 메르세데스의 MGU-H 기술력은 경쟁사였던 르노, 혼다보다 1~2년 앞서 있었다고 평가받는다. 그리고 메르세데스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8년 연속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
한편 MGU-H는 2025년을 마지막으로 F1 파워유닛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진다. 기술적으로 구현이 너무 어렵고 개발에 큰 비용이 드는 탓에 새로운 F1 엔진 제조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장착된 MGU-K와 달리 MGU-H는 F1 등 고성능 레이스카에만 있는 특별한 시스템이었다. 일반 운전에서는 터보 가속 지연이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에 사용되는 에너지 흐름 제어 컴퓨팅 기술로는 다룰 수 없으며, 전용 터보와 전기모터, 냉각 시스템 등이 수반 되는 탓에 가격이 비싸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 MGU-H가 있었기 때문에 1.6L V6 엔진으로도 V8 시절과 동일한 혹은 그보다도 강한 엔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MGU-K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 최대 출력을 기존 120kW(약 160마력)에서 350kW(약 475마력)로 3배 가까이 대폭 늘릴 예정이다. MGU-K는 차량이 감속할 때 만들어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저장하고, 가속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파워유닛(PU) 제작 팀과 구매 팀


끝나지 않은 친환경으로의 전환
2026년, 달라지는 것은 또 있다. 100% 탄소중립 합성연료(E-Fuel)가 F1에 도입된다. 앞서 FIA는 2019년, “2030년까지 ‘넷 제로(탄소 순 배출 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체 F1 운영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파워유닛의 효율을 개선하는 것부터 항공운송을 줄이고, 서킷의 자재를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교체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E-Fuel 역시 F1을 지속 가능한 모터스포츠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E-Fuel 은 수소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만든 액체 연료다. 물을 수소와 산소로 전기분해해 수소를 만든 다음,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반응 조건에 따라 합성 메탄올, 합성 휘발유, 합성 디젤 등 다양한 액체 연료로 합성된다. 이 연료들은 기존 엔진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F1에서 2026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E-Fuel은 특수 합성 휘발유다. 연료를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만 연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총 배출량을 ‘0’로 맞출 수 있다.
F1은 트랙을 달리고, 트랙은 지구 위에 있다. 전세계가 열광하는 속도의 경쟁도 지구가 내일을 보장할 때에나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레이스카의 변화는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