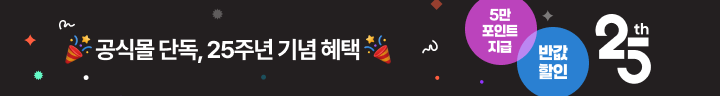1950년 첫 번째 포뮬러 1(F1) 그랑프리가 개최된 이래 총 32명의 드라이버가 경기 중 사망했다. 테스트 혹은 비공식 주행 중에 사망한 이까지 더하면 총 52명의 드라이버가 F1에서 목숨을 잃었다. F1은 안전을 위한 조처를 해야 했다. 드라이버들의 목숨을 살리는 과학기술을 살폈다.
편집자 주


1953년 이탈리아 모데나 그랑프리에서 샤를 드 토르나코 당시 페라리 드라이버가 연습 주행 중 사망했다. 비극은 이어졌다. 1954년에는 독일 뉘르부르크 그랑프리에서, 1955년에는 프랑스 파우 그랑프리에서 드라이버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F1 레이스카를 타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52명의 드라이버 중 무려 29명이 1950~1960년대에 사망했다. 이 시기 F1에선 1년에 1.45명꼴로 드라이버가 사망한 셈이다. 드라이버의 죽음이 이토록 흔했던 이유는 당시 F1에서는 안전벨트조차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안전벨트는 1972년에 이르러서야 착용이 의무화됐다. 1952년 의무화된 헬멧도 이 시기엔 가죽 혹은 섬유 재질로 만든 경량 보호구였기 때문에 인명 보호엔 역부족이었다.
우주비행복과 F1 드라이버 슈트는 닮았다
안전보다는 속도, 그리고 승리가 우선되던 트랙에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였다. 99번의 경기에 출전해 무려 27회나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F1 드라이버, 재키 스튜어트가 1966년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사고를 당한 후 안전 운동을 전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스튜어트의 주도로 차량이 충돌할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호벽이 세워졌고 그랑프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의료 및 소방 인력이 대기하는 현장 구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 것도 안전 운동의 결과였다.
스튜어트가 주도한 안전 운동은 F1에서 방염 슈트가 의무화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F1 차량은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엔진과 고압의 연료 시스템이 탑재돼 있어,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료가 누출돼 불이 붙는 경우가 많았다. 드라이버들은 크고 작은 화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앞서 1963년, 국제자동차연맹(FIA)은 “드라이버는 난연성 소재의 슈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었다. 난연성 소재란 발화점이 높아 불에 잘 타지 않거나 불이 붙더라도 연소 속도가 느리고 쉽게 꺼지는 성질이 있는 재료다. 하지만 이는 권고 수준이었고 빈틈이 많은 규정이었다. 몇몇 드라이버들은 면으로 만든 슈트에 약간의 방염 처리만 한 뒤 착용하기도 했다. 스튜어트의 안전 운동 덕택에 1975년, 소재와 제작 방식이 엄격하게 규정된 방염 슈트가 F1의 공식 규정으로 채택됐으며 노멕스 섬유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노멕스는 1960년대 초, 미국 화학·소재 회사인 듀폰이 개발한 고분자 소재다. 노멕스 섬유는 불에 잘 타지 않고 불이 붙어도 스스로 꺼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타고난 난연성에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1960년대 우주복 및 우주선 내 장비를 만드는 데 노멕스를 적극 활용했다. 실제로 노멕스가 모터 스포츠계에 처음 알려지게 된 것도 미국 우주비행사, 피트 콘래드의 소개 덕분이었다.
이후 50년간 방염 슈트는 진화 과정을 밟아 나갔다. 더운 지역에서도 F1 그랑프리가 개최됨에 따라 슈트는 화재로부터 드라이버들을 보호해야 하는 동시에 드라이버들의 땀을 잘 배출하는 통기성까지 잡아야 했다. 이에 F1을 주관하는 FIA는 노멕스를 얇게 3겹으로 구성해 슈트를 제작했다. 슈트에 관한 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2000년에 도입된 드라이버 의류 공식 규격은 방염 슈트가 800℃의 화염에서 10초 이상 견디는 내화성을 요구했지만, 2018년 개정된 최신 규격은 슈트가 같은 온도에서 12초 이상 견뎌야 하도록 정했다.
속도와 충돌에서 생명을 지키는 장치들

헤일로(HALO)
개방형 조종석 구조의 차량에서 드라이버 머리 쪽으로 날아오는 물체를 막아주는 막대 구조물. 헤일로는 약 12t(톤) 이상의 수직 하중을 견딜 수 있고, 20kg 물체가 시속 225km로 날아와도 막아낸다.
헬멧
헬멧은 탄소 복합 소재의 외피, 폼 라이너, 내화성 라이닝(헬멧 내부에 덧대어진 안감) 등 크게 3개 층으로 구성된다. 헬멧은 드라이버의 머리 형태에 맞춰 맞춤 제작하며 무게는 1250g밖에 되지 않는다.

장갑
장갑은 F1 드라이버 의류 중 가장 방염 성능이 떨어진다. 섬세한 조종을 위해서다. 일부 장갑에는 생체 인식 센서가 탑재돼 있어 심박수나 산소 포화도 등 드라이버들의 생체 신호를 측정한다.
내화성 속옷
드라이버들이 슈트 아래 착용하는 속옷도 화재에 강한 노멕스 소재로 만든다. 특히 드라이버들이 헬멧을 쓰기 전 착용하는 흰색 발라클라바도 노멕스로 만든 내화성 속옷이다.
한스(HANS)
헬멧과 연결된 머리 및 목 지지대. 경기 중 사고가 나면 한스와 헬멧을 연결한 끈이 머리를 잡아당겨 움직임을 제한한다. 받침대는 목에 전달되는 충격을 분산해 목뼈가 꺾이거나 부러지는 것을 막는다.
일체형 방염 슈트
사고가 발생하면 손상된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 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는 노멕스 소재로 제작해 800℃ 이상에서도 12초 동안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슈트가 필요하다.

월드 챔피언의 죽음, 안전 개혁을 촉발하다
1981년, 스포츠카 레이서 짐 다우닝은 자신의 친구 드라이버들이 ‘기저두개골 골절’로 연달아 사망하는 것을 봤다. 기저두개골 골절은 머리뼈의 바닥 부분이 부러진 것으로 머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발생한다. 이에 다우닝은 자신의 처남, 로버트 허버드 미국 미시간대 생체역학 교수에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허버드 박사는 머리와 목 그리고 상체를 함께 지지하는 장치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1985년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진 장비가 바로 ‘한스(HANS·Head and Neck Support System)’다. 한스는 어깨 위에 지지대를 올리고 지지대와 헬멧을 연결해, 레이스카가 충돌할 때 드라이버들의 목과 머리가 과도하게 앞으로 튀어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F1이 한스에 주목한 것은 개발 뒤 9년이나 지난 1994년이었다. 이탈리아 이몰라에서 두 명의 드라이버가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었다. 4월 30일, 롤란트 라첸버거 당시 심텍 포드 F1팀 드라이버가 퀄리파잉(그랑프리 출발 순서를 정하는 예선 경기)에서 시속 320km로 달리다가 벽과 충돌해 사망한 데 이어, 그다음 날인 5월 1일에 개최된 그랑프리 결승 레이스 도중 아일톤 세냐 당시 윌리엄스 F1 팀 드라이버가 시속 31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았다. 이 충돌로 레이스카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서스펜션 부품이 튕겨 나와 세냐의 두개골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
F1 통산 3회 월드 챔피언이었던 세냐의 죽음은 F1에 전면적인 안전 개혁을 촉발했다. FIA는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의 차량 설계를 의무화했고, 차량 섀시(뼈대 구조)의 강도도 강화했다. 고속으로 코너를 돌아야 하는 서킷에는 탈출 공간인 ‘런오프 존’을 확대했다. 콘크리트로만 만들었던 충돌 벽 역시 차량이 부딪혔을 시 충격을 완화하고 에너지를 흡수하면서도 차량이 관통하지 못하도록 다층 구조로 제작했다. 차량이 충돌 벽과 부딪혔을 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벽의 곡률과 각도도 다시 설계했다.
무엇보다 FIA는 메르세데스 F1팀과 함께 1996년부터 3년간 한스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에어백을 레이스카 내부에 장착하는 것도 고려됐지만 여러 실험을 통해 한스가 에어백보다 드라이버를 보호하는데 훨씬 효과적인 것이 드러났다. 1999년 마침내 F1에 특화된 한스 설계가 완성됐고, 2003년 FIA는 F1에서 한스 사용을 의무화했다.
F1 한스 지지대는 탄소섬유로 제작된다. 탄소섬유란 탄소(C) 원자가 가닥처럼 이어져 만들어진 섬유 재료다. 탄소가 92% 이상 첨가돼 강철과 비교했을 때 무게는 5분의 1 수준이지만 인장강도는 10배, 탄성은 7배에 달할 정도로 튼튼하다. 탄소섬유로 만든 지지대는 무게 약 450g으로 양쪽 어깨 위에 올렸을 때 부담이 거의 없다.

2층 버스를 버티는 구조물 헤일로, 생명을 구하다
“제발 아니라고 해줘! 이건 F1 역사상 가장 보기 흉한 변형이야. 안전을 위한 시도는 이해하지만, 내게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F1이 완벽해.” “만약 (헤일로를) 도입하게 된다면,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제 차에는 쓰지 않을 겁니다.” 2016년, 루이스 해밀턴 당시 메르세데스 F1팀 드라이버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뷰에서 헤일로(HALO) 도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냈다.
헤일로(halo)는 영어로 후광, 또는 천사의 고리란 뜻이다. 드라이버의 머리를 둥글게 감싸며 보호하는 구조물인 헤일로는 그 생김새가 마치 후광 같다고 해 그런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헤일로는 열린 조종석 디자인 전통을 65년간 유지하던 F1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디자인 미관을 훼손한다는 이유 외에도 정문 중심에 기둥이 위치해 드라이버의 시야를 가린다는 의견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에서 빠르게 탈출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몇몇 드라이버와 팬들의 반발에도 FIA는 드라이버의 머리를 보호해야 했다.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2014년 10월, 일본 그랑프리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형성됐다. 경기 전부터 내린 폭우로 트랙이 미끄러웠던 탓에 한 드라이버가 방호벽과 충돌했고 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크레인이 들어왔다. 쥘 비앙키 당시 마러시아 F1팀 드라이버는 시속 약 200km로 코너를 돌다가 이 크레인과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혼수상태에 빠진 비앙키는 2015년 7월 사망했다.
비앙키의 사고 후 메르세데스 F1팀이 헤일로를 구상해 제안했다. 헤일로는 총 3개의 지지대를 갖는 구조다. 당시 FIA는 헤일로 외에도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윈드스크린, 윈드스크린과 헤일로를 결합한 보조 장치까지 총 3종류의 보호 장치를 검토했지만 다양한 실험을 거쳐 헤일로가 드라이버들의 머리를 보호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헤일로는 우주항공 등급의 티타늄(Ti) 합금으로 제작된다. 티타늄 합금은 조성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우주항공 등급 티타늄 합금은 우주의 극한 압력과 온도 환경에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공된 고품질 소재로 매우 강하면서도 가벼워 제트기 엔진이나 위성을 만들 때 사용한다.
헤일로는 약 9kg, 여기에 헤일로를 고정하는 지지대 무게까지 더하면 총 15kg이다. 0.01초가 순위를 가르는 F1에서 15kg은 매우 큰 무게 증가다. “보통 레이스카 무게가 1kg 증가하면 약 0.03초가 손실됩니다.” 7월 9일, 김남호 전 알핀 F1팀 시니어 퍼포먼스 엔지니어가 말했다. “하지만 2017년 대비 2018년의 레이싱카 총무게가 15kg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 FIA 기술 규정에 따르면, 2017년 F1 차량의 최소 무게는 728kg이었으나, 2018년에는 733kg으로 5kg밖에 늘지 않았다. 김 전 엔지니어는 “당시 모든 F1 팀은 다른 부분에서 무게를 줄여 2018년 차량은 0.2~0.3초 정도만 느려졌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헤일로를 이용해 다운포스를 더 늘린 팀도 있었습니다.” 김효원 윌리엄스 F1팀 공기역학 엔지니어는 e메일 인터뷰에서 “헤일로를 감싸는 외피를 개발할 수 있게 한 규정을 활용한 결과”라며 “공기역학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심지어 다운포스를 더 늘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시 드라이버 탈출에 방해가 된다는 우려 역시 계속된 연구와 실험으로 해소됐다.
헤일로는 12t(톤) 이상의 수직하중을 견딜 수 있다. 이는 런던의 명물인 빨간색 2층 버스 한 대의 무게에 달한다. 실제로 2층 버스를 헤일로 위에 올려 본 적은 없지만, 2021년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레이스카 위에 레이스카가 올라간 사고는 헤일로의 기능과 효과를 입증했다. 피트스탑으로 타이어를 교체한 해밀턴이 트랙에 복귀하자, 막스 베르스타펜 레드불 레이싱 F1팀 드라이버가 그의 바로 뒤로 따라붙었다. 베르스타펜은 코너에서 해밀턴의 안쪽을 찌르며 추월을 시도했지만, 그 순간 높은 연석을 밟으며 레이스카가 불안정하게 떠올랐고 곧 해밀턴의 뒤쪽 타이어와 접촉해 충돌했다. 충돌로 베르스타펜의 차량은 더 크게 튀어 올라 해밀턴 위로 향했고, 해밀턴은 헤일로가 없었다면 베르스타펜의 뒤-오른쪽 타이어에 머리를 밟힐 뻔했다. 헤일로의 강력한 반대자였던 해밀턴은 사고 이후 “헤일로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그 누구의 죽음도 당연하지 않다
2020년, 바레인 그랑프리에서 발생한 로만 그로장 당시 하스 F1 팀 드라이버의 사고는 F1이 70년간 쌓아 올린 안전 기술의 승리라 불린다. 당시 그로장은 시속 약 192km의 속도로 가드레일에 정면충돌했다. 차량은 전복되고 유출된 연료 때문에 레이스카에 불이 붙었다. 그로장은 무려 28초 동안 불 타는 차량에 갇혀 있었다.
모두가 머리를 감싸 쥐고 입을 틀어막은 순간, 그로장은 전복된 차량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정밀 검사를 받았던 그로장은 골절된 데 없이, 손과 발목에 2도 화상(피부 표피와 진피가 손상된 화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헤일로가 정면으로 부딪친 가드레일의 충격을 흡수했고, 난연 노멕스 슈트가 28초라는 긴 시간 동안 불을 막아 그로장이 탈출할 시간을 벌어줬다. 또한 현장에 배치된 안전 요원과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응해 화재를 진압하며 그로장의 탈출을 도왔다. 1950~60년대 죽음이 당연했던 F1은 수많은 드라이버의 희생 결과 변화했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은 F1에서 속도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