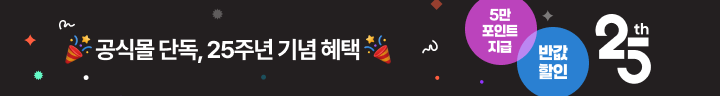“멋진 타겟인데요?”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7000마일(1만 1265km) 떨어진 미국 네바다주 크리치 공군기지의 비좁은 통제실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던 한 드론 조종사가 말했다. 2001년, 9.11테러를 감행한 테러 조직, 알카에다를 지원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에서 드론을 적극 도입해 ‘안전한’ 살상을 노렸다. 미국 언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드론 조종사는 조이스틱으로 드론을 움직이며 상공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보다가, 어딘가로 향하던 아프가니스탄인 집단을 포착하고선 ‘타겟’을 운운하는 무전 통신을 남겼다.
미군 드론 조종사가 주시하던 타겟은 어린아이가 포함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집단이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그중 다수는 수년간 탈레반에게 가혹한 대우를 받아 온 소수 민족, 하자라족이었다”고 보도했다. 추후 드러난 당시 조종사 간 무전 통신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미군은 이들을 무기를 지닌 적이라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미군 집계에 따르면 해당 공격으로 남성 15~16명이 사망하고 여성 1명과 어린이 3명을 포함한 12명이 부상당했다. 이들은 생필품을 사러, 학교에 가기 위해, 병원에 치료를 받고자 이동 중이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적처럼 보이면 버튼을 누르는 ‘전쟁 게임’을 방불케 하는 사례였다.
만약 7000마일 떨어진 네바다주가 아닌 700m거리의 저격수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스무 명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은 무사히 살아 목적지로 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 드론 조종사들은 다르다. 드론 조종사는 실제 전장에 투입되지 않는다. 오로지 화면만 주시하며 조종간으로 드론을 조작하고 버튼을 눌러 목숨을 빼앗는다.
2010년, 전직 유엔(UN) 인권특별보고관인 필립 알스턴 미국 뉴욕대 법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플레이스테이션 사고방식(Playstation Mentality)’이라 칭했다. 드론 조종이 마치 비디오 게임을 조작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조명한 용어다. 즉, TV 모니터 앞에 앉아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하듯, 군인이 전쟁에서 모니터를 보며 드론을 조작하며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알스턴 교수는 UN 보고서를 통해 “드론 조종사는 전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살상에 대한 플레이스테이션 사고방식이 생길 위험이 있다”며 “국제인도법 등 적절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화면 속 게임이 된 전쟁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드론 전쟁의 위험성을 꾸준히 지적해 오던 휴 거트슨 영국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인류학과 교수는 과학동아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대전을 ‘사냥’에 빗댔다. “전통적인 전투에서는 서로 희생당합니다. 반면 드론은 한쪽이 부상이나 죽음의 위험 없이 상대를 죽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드론 조종사는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총을 쏘고, 피가 튀는 상황을 겪는 병사와는 달리 추상적이고 정제된 방식으로 살상을 수행하죠. 이들은 총격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전쟁과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멀어지는 겁니다.”
프랑스 공군에서 군인으로 27년을 근무한 뒤 현재는 기술 철학에 관해 연구 중인 에마누엘 고피 프랑스 파리디지털테크놀로지대 윤리학과 교수 또한 같은 의견을 전했다. 인터뷰에서 고피 교수는 “드론은 전투원을 작전 지역에서 더 멀리 떨어뜨리면서 거리감과 무감각을 심화시켰다”며 “드론 탓에 ‘편리한 살상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군인이 전장과 멀리 떨어진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드론 조종사를 일부러 전장 가까이 배치하기도 하며, 조작 화면의 화질을 향상시켜 화면이 주는 단절감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드론이 끌어내린
전쟁의 무게감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은 이란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이란이 팔레스타인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양국은 12일간 드론 1000여 대를 동원했다. 이스라엘에서 민간인 포함 최소 24명, 이란에서 2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팔레스타인 민간 무장 단체인 하마스,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미 전쟁을 벌이며 병력을 소모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란까지 침공할 여유가 있었을까. 이 또한 드론의 힘이었다.
여러 연구에서는 병력을 직접 파병해야 했던 전통적인 전쟁과 다르게, 무인 전쟁을 이끄는 드론으로 전쟁이 더 자주 일어날 수도 있단 우려를 제기한다. 제임스 윌시 미국 샬럿 노스캐롤라이나대 정치학과 교수는 2015년 마커스 슐츠케 전 캐나다 요크대 국제관계학 교수 등과 함께 ‘드론 공격의 윤리’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들은 3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드론을 사용할 때와 다른 유인 전투를 할 때 대중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했다. 윌시 교수는 “참가자들은 드론 공격과 관련된 무력 사용을 더욱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드론은 많은 비판자들이 예측했듯이 전쟁을 일으키는 데 대한 저항감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전쟁이 원격화·무인화되며 심리적 거부감이 낮아지자 전쟁을 더욱 쉽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 아마드 알리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전략비전연구소 연구원은 드론이 정치·사회적 저항을 감소시켜 무력 개시 가능성을 높인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doi: 10.61732/bj.v3i1.94 드론은 정밀 타격으로 무의미한 희생자를 줄인다는 논리로서 전쟁에 대한 부채감을 던다는 분석이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드론을 적극 기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피 교수는 이렇게 드론이 사람들의 전쟁 인식을 흐려놓으며, 결국 전쟁을 벌일 국가가 정당성을 쉽게 확보한다고 꼬집었다. “드론은 군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많은 민주국가에서는 병력을 파견하려면 법률을 통한 대중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쟁 개시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국민 여럿이 희생되니까요. 하지만 드론은 이 모든 걸 회피할 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드론을 사용하면 굳이 병력을 전장에 파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시민들도 자기 가족이 희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전보다는 전쟁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고요. 드론은 정부가 마치 게임기를 켜듯 군인 투입 없이 전투를 시작할 매우 편리한 수단이 됐습니다.”

드론, 갈수록 민간인 희생자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