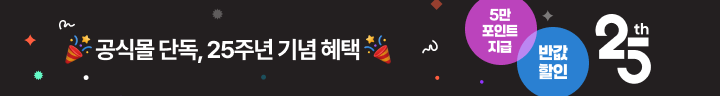“열린 양자 계에서 시간의 반대 방향 화살표가 등장하다
(Emergence of opposing arrows of time in open quantum systems).”
1월 29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된 한 논문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단방향 화살표로 인지합니다. 시간은 항상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
그것이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라고 믿죠. 그런데 이 논문의 제목은 그 반대 방향 화살표, 즉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흐르는 현상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1월 29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열린 양자 계에서 시간의 반대 방향 화살표가 등장하다”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됐을 때 기자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시간의 반대 방향 화살표라니,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보였죠. 연구를 이끈 안드레아 로코 영국 서리대 수학 및 물리학과 교수는 SCIE급 학술지(미국의 분석 회사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선정한 수준 높은 학술지)에 논문을 십수 건 낸 연구자라, 이 논문이 헛소리일 것 같지 않았고요. 벌써 미국의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나 영국의 ‘뉴 사이언티스트’ 등 과학전문지에는 ‘양자 세계에선 시간이 거꾸로도 간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떴습니다. doi: 10.1038/s41598-025-87323-x
두근거리며 논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논문을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처음 보는 수식이 무려 80개 줄줄이 이어진 이 논문을 함께 읽어줄 과외 선생님, 박권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교수를 찾아 4월 8일 고등과학원으로 향했습니다. 박 교수는 양자 물질로 이뤄진 시스템을 연구하는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에서 시간은 다르다
“인터뷰 전에, 고등과학원의 동료들과 논문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논문 내용이 학계에 잘 정립된 관점과 상반되는 것 같아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든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기자를 만나자마자 꺼낸 말은 예상외였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이 뭐가 이상한지를 알기 위해서도 꼭 논문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박 교수에게 자세한 설명을 청했습니다. 그는 우선 물리학에서 말하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는 “물리학에서는 기억을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을 판단한다”며 운을 뗐습니다. 과거에 벌어진 일은 어떤 식이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뇌에 기억이 남아있거나, 어디에 적어 놨거나요. 물체와 물체가 부딪혔다면 부딪힌 후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죠. 한편, 우리는 미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서, 현재 물체를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이 물체가 미래에 어떤 상태가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화살표인 겁니다.
이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영원히 왕복운동을 하는 진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물체입니다. 과거에도 왕복운동을 했고요, 지금도 왕복운동을 하고 있고요, 미래에도 왕복운동을 하겠죠. 현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에 벌어질 운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운동. 이런 운동을 물리학에서는 ‘시간 역전 대칭성’이 있는 운동이라고 봅니다. 시간을 앞으로 돌리나, 뒤로 돌리나 같으니까요.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시간 역전 대칭성을 가진 물체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래에 벌어질 운동을 통해 과거의 운동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역전 대칭성은 미시세계에서 잘 나타납니다. 접시 속 물에 꽃가루를 흩뿌려 놓으면, 꽃가루가 물 분자에 부딪히면서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이처럼 액체나 기체 속에서 먼지 같은 작은 입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통틀어 브라운 운동이라고 합니다. 작은 입자가 유체 속 분자와 부딪히며 표류하는 거죠. 이때 입자의 충돌 하나하나는 미시세계의 운동법칙을 따릅니다.
꽃가루가 물 분자 하나와 부딪혀 이동경로가 바뀌는 현상만 볼까요. 전체 꽃가루의 움직임을 아주 잘게 나눈 이 현상에는 시간 역전 대칭성이 있습니다. 당구공이 벽면과 부딪힐 때처럼요. 11시 방향에서 온 당구공이 6시 방향에 있는 벽면에 튕겨 1시 방향으로 나가는 경로와, 1시 방향에서 온 당구공이 6시 방향에 있는 벽면에 튕겨 11시 방향으로 나가는 경로는 정확히 같습니다. 꽃가루와 물 분자의 충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 분자와 충돌한 이후 경로를 보고 이 꽃가루가 충돌 전에는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유추할 수 있죠. 박 교수는 “뉴턴이나 슈뢰딩거 등이 고안한 미시 세계를 나타내는 대부분 방정식은 시간 역전 대칭성이 있는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시세계에서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유리병이 쨍그랑 깨지고 나서 다시 저절로 원상복구되는 일은 이상합니다. 유리병에게 시간은 단방향입니다. 꽃가루가 물분자 여러 개와 충돌하는 연속적인 움직임 또한 거시세계에 속하죠. 꽃가루가 갑자기 5분 전 과거의 위치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미시세계의 법칙에는 모두 시간 역전 대칭성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거시세계에는 시간이 존재할까요?” 박 교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법칙이 바로 ‘열역학 제2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시간 역전 대칭성, 거시세계에서도 깨지지 않는다?
열역학 제2 법칙은 다른 말로 엔트로피(무질서도) 증가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고립된 계의 엔트로피는 언제나 증가하고, 감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고립된 계란, 외부와 에너지나 입자를 교환하지 않는 공간을 말합니다. 인간이 아는 한, 유일한 고립된 계는 우주입니다. ‘우주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문장에는 사실 시간에 대한 내용이 생략돼 있습니다. 풀어 적자면 우주에선 과거에 비해 미래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열역학 제2 법칙은 무질서도가 증가함을 말하면서, 우주에서 시간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법칙인 셈이죠.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면, 그건 시간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진자 운동과 깨진 유리병을 생각해 보죠. 사실 거시세계 속 진자는 가만 내버려두면 언젠가 멈추기 마련입니다. 줄의 마찰열 등으로 에너지가 점차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진자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의 형태로 바뀌어 우주로 흩어지는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유리병이 깨져 무작위 파편 조각들이 되는 것도 엔트로피가 증가한 현상이고요. 이들에겐 모두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겠죠. 엔트로피가 적용되기에, 거시세계에선 시간이 반드시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겁니다.
박 교수는 “이 논문에서는 식을 유도해서, 미시세계에서 적용되던 시간 역전 대칭성이 거시세계에서도 유지된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거시세계의 현상에는 시간 역전 대칭성이 적용되지 않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미시세계에서 거시세계로 확장할 때 왜 엔트로피가 도입돼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만 흐르고, 시간 역전 대칭성이 깨지는 걸까요? 박 교수는 “물리학자들이 품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라면서 “이걸 풀기 위한 한 방식으로 ‘마르코프 근사법(Markov approximation)’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코프 근사법이란, 미시세계의 입자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 뒤에 그 입자가 ‘기억상실증’을 겪는다는 가정입니다. 물 분자와 충돌한 뒤 꽃가루의 진행 방향을 보면, 이 꽃가루가 벽면과 충돌하기 전에는 어느 방향에서 오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마르코프 근사법을 이용하면 꽃가루가 이 기억을 애써 상실합니다. ‘꽃가루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현재 상태에만 달려있다’는 가정입니다. 그 덕에 마르코프 근사법을 이용하면 현재 상태만 가지고 입자의 미래 운동을 계산하면 되니, 계산이 간편해지죠. 아주 거친 가정이긴 하지만요.
양자역학에서 개별 입자, 즉 물질의 상태를 기술하는 법칙으로는 슈뢰딩거 방정식이 있습니다. 슈뢰딩거 방정식은 미시세계에 적용되는 방정식이므로 시간 역전 대칭성이 있습니다. 슈뢰딩거 방정식에 마르코프 근사법을 적용해 거시 세계로 확장한 방정식을 ‘린드블라드 방정식(Lindblad equation)’이라 합니다. 로코 교수팀이 새롭게 진행한 연구가 바로 이 방정식과 관련돼 있습니다. 연구팀은 브라운 운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죠. 미시세계에서 꽃가루 하나하나가 물 분자에 부딪히는 현상에 슈뢰딩거 방정식을 적용해 풉니다. 그리고 이 현상에 마르코프 근사법을 적용한 다음, 전체 꽃가루의 움직임에 대한 린드블라드 방정식을 유도한 겁니다.
박 교수는 “원래는 슈뢰딩거 방정식에서 린드블라드 방정식을 유도하면, 결과물인 린드블라드 방정식에서 엔트로피가 적용되는 결론이 나온다”며, “시간 역전 대칭성이 깨지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물리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논문에선 마르코프 근사법을 아주 잘 썼더니 시간 역전 대칭성이 깨지지 않은 린드블라드 방정식이 유도됐다고 주장합니다.”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멀리 왔습니다. 이 논문이 왜 학계의 주장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건지 드디어 알게 됐군요.


그래도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불가능합니다!
논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로코 교수팀은 논문에서 자신들의 린드블라드 방정식 유도가 기존 학계의 결론과 달랐던 이유가 “마르코프 근사법을 사용할 때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는) 시간의 흐름을 임의로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접근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마르코프 근사법을 적용한 순간 물체의 기억은 시간에 대한 짝함수가 된다고 봤고, 그 덕에 마르코프 근사법을 사용했음에도 시간 역전 대칭성이 유지되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앞서 마르코프 근사법을 적용하면 입자가 기억을 상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기억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상태만 보고 미래의 운동을 계산하죠. 연구팀은 이 기억상실이 단순히 ‘기억=0’이 되는 상태, 즉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기억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x축이 시간, y축이 기억인 좌표평면에 물체가 가진 기억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그래프에서 x=0일 때의 y값은 현재 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말할 겁니다. x값이 커질수록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니 y값, 즉 기억도 점차 더 많아지겠죠. 이게 마르코프 근사법을 적용하기 전, 물체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마르코프 근사법을 적용한 순간부터 물체의 기억은 시간에 대한 짝함수’라고 봤어요. 짝함수란 y축에 대해 좌우대칭형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 즉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억에 대한 그래프가 좌우대칭형이란 뜻입니다.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렀을 경우에 축적된 기억과 미래에서 과거로 흘렀을 경우에 축적된 기억이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입자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현재 상태에 달려있다는 마르코프 근사법을 현재 상태의 기억이 ‘0’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현재 상태의 기억이 과거에서 얻은 것이거나 미래에서 얻은 것이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만 보고 앞으로의 현상을 해석하자는 것이죠.
이상하죠? 이 개념을 확장해 보면 더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박 교수는 “연구팀의 말대로라면 엔트로피가 미래로 가도, 과거로 가도 증가한다”면서 “우리가 미래로 가도, 과거로 가도 늙는 식이고, 유리병이 미래로 가도 과거로 가도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문에선 “만약, 빅뱅이 일어난 순간에 마르코프 근사법을 적용한다면, 세상에는 시간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우리의 우주와 시간과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또다른 우주 두 가지가 생기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연히 시간이 증가하는 우주에서 살게 된 셈”이라고도 상상했습니다.
“결국 시간의 반대 방향 화살표를 가진 우주가 존재한다는 건, 우리도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단 건가요?” 기자의 물음에 박 교수는 “이 논문에서 말하는 바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아니다”라면서 “시간의 방향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연구가 논문으로 나왔다고 모두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연구 또한 유도 과정에 어떤 실수가 있어서 시간 역전 대칭성이 깨지지 않은 린드블라드 방정식을 유도했을 수도 있죠.
시간이 양방향으로 흐른다는 이 이론에 대해선 앞으로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할 겁니다. 박 교수는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많다”면서도 “그래도 이론은 뭐가 잘못됐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즐겁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미래로 가도, 과거로 가도 늙는 세상에 사는지. 아니면 시간은 언제나 그렇듯 과거에서 현재로만 흐르는지. 과학이 밝혀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