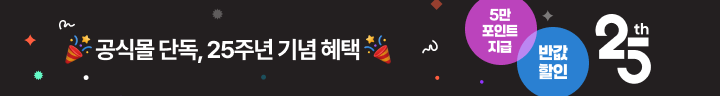부드러운 깃털과 날개,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는 사실 공룡의 멸종하지 않은 후예다.
하늘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티라노사우루스가 다름 아닌 참새와 먼 친척인 것이다.
이들은 인간과 원숭이처럼 진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구분지을까?
3월 17일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그 차이가 다름 아닌 ‘두개골’에 있다고 말한다.
새는 멸종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공룡이다. 새와 공룡 사이엔 공통점이 많다. 참새와 티라노사우루스를 떠올려 보자.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참새도, 티라노사우루스도 두 다리로 걷는다는 부분이다. 참새와 티라노사우루스 모두 ‘수각류’라고 하는 공룡의 종에 속하는데, 두 다리로 걷고, V자 모양의 쇄골뼈를 가지고 있는 건 수각류의 주요한 특징이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거대 파충류’처럼 그리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다면, 새에겐 깃털이 있고 공룡에겐 없지 않느냐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고생물학계에선 티라노사우루스에게도 깃털이 있었을 거란 설이 우세하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티라노사우루스와 가까운 친척인 유티라누스(Yutyrannus huali)나 딜롱(Dilong pardoxus)같은 공룡에서 깃털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들과 티라노사우루스는 진화적으로 가까우니, 티라노사우루스에게도 깃털이 있었을 거란 추측이다.
그렇다면 새는 뭐가 달랐기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하늘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최신 연구가 밝힌 ‘새의 조건’을 소개한다.
새, 유연한 두개골로 마지막 승리자가 되다
인류와 침팬지, 그리고 원숭이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두개골의 크기다. 3월 17일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날지 못하는 공룡과 새를 구분할 때도 같은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새’라는 공룡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이유도 두개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목한다. doi: 10.1073/pnas.2411138122
미국 시카고대와 미주리대 등 공동연구팀은 드로마에오사우루스(Dromaeosaurus albertensis) 등 멸종한 수각류 공룡과 시조새(Archaeopteryx lithographica), 그리고 회색앵무(Psittacus erithacus) 등 조류까지 총 19종의 공룡 두개골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수각류 공룡이 새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두개골의 형태가 점차 단순해지고 유연성을 갖추게 됐음을 밝혔다.
포유류의 두개골과 달리 새나 뱀, 물고기 등의 두개골은 단단히 굳어 있지 않다. 대신, 신생아의 두개골이 큰 뼈조각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틈으로 이뤄져 말랑한 것처럼 유연하다. 덕분에 새의 두개골은 주변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연구팀은 이 특징이 언제, 어떻게 발달됐는지 알아내기 위해 19종의 공룡 두개골을 컴퓨터 단층촬영(CT)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활용했다. 컴퓨터 상에 뼈를 3차원으로 나타낸 다음, 여기에 근육을 붙여 두개골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한 것이다.
연구를 이끈 캐시 할리데이 미주리대 병리학 및 해부학과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분석 결과, 새가 진화 과정에서 뇌와 두개골의 용량을 키웠고, 두개골이 점점 더 유연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유연한 두개골은, 현대 새와 그들의 조금 더 공룡스러운 조상들을 가르는 명확한 구분선”이라고 말했다.
할리데이 교수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과학자들은 그간 새와 그 외 공룡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려면 새에게는 있고, 시조새처럼 새로 분류되지 않는 공룡에는 없는 특징을 찾아야 한다. 깃털은 새에게도, 시조새에게도 모두 있었으니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는 두개골에서 둘의 차이를 분명히 찾았다. 시조새의 두개골은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쉽게 형태를 바꾸지 않았던 반면, 새는 유연하게 움직이는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말랑한 두개골’은 새와 그 외 공룡을 가르는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유연한 두개골은 진화적으로 큰 이점이 됐다. 두개골이 유연하다는 건 머리와 턱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앵무새가 부리를 손처럼 유용하게 쓰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 두개골이 단단하다면 그런 자유로운 움직임은 어렵다. 연구에 참여한 알렉 윌켄 시카고대 생물학과 연구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를 들어 앵무새는 부리를 이용해 나무를 타고 오를 수 있고, 다른 새들은 그 힘을 이용해 견과류나 씨앗을 깨뜨릴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부리가 손처럼 기능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먹을 때 입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다양한 크기와 재질의 먹이를 입에 넣을 수 있게 도와주므로, 먹이를 얻고 살아남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리로 물고기를 잡거나, 견과류를 깨거나, 커다란 먹이를 한 입에 삼키는 등 기상천외한 형태로 적응하며 살아남은 새의 비밀은 다름 아닌 유연한 두개골에 있었던 셈이다.
새 두개골의 진화과정

어설프게 날개를 ‘펼치고’ 점프하던 새의 조상들
새는 날짐승이다. 이들의 중요한 특징은 다름 아닌 ‘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성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고생물학 연구실 연구원은 4월 3일 인터뷰에서 “많은 현생 새는 날개를 퍼덕여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러한 능력은 비조류 공룡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 공룡과 새의 구분은 현재까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생 새의 중요한 특징인 깃털과 비행, 알을 낳는 것, 이빨이 없는 부리 등은 모두 일부 비조류 공룡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개를 퍼덕여 추진력을 얻는 비행은 현생 새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생 새는 가슴뼈가 배의 용골과 같이 발달해 있어서, 날개를 움직이는 근육이 매우 크게 붙는 것이 가능하죠. 이 변화를 비조류 공룡과 새를 구분하는 핵심 변화로 꼽을 수 있습니다.”
날개를 퍼덕여 비행하기 위해선 근육이 필요하다. 2023년 타츠야 히라사와 일본 도쿄대 지구행성과학과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새 날개 앞부분에서 어깨와 손목 사이를 잇는 근육 구조 ‘전피막(propatagium)’이 날지 못하는 공룡과 새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점이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주로지컬 레터스(Zoological Letters)’에 발표했다. doi: 10.1186/s40851-023-00204-x
인간의 팔 구조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전피막은 손목뼈와 팔꿈치, 어깨뼈 세 지점을 감싸고 있는 삼각형 모양의 피부막이다. 우리가 가장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아는 조류, 닭으로 설명하면 더 쉽다. 닭 날개는 어깨부터 손끝까지 상완골, 요골과 척골(두개의 긴 뼈로 이뤄진 부분), 그리고 손바닥뼈까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피막은 상완골과 요골을 연결한다(눈썰미가 좋은 독자라면 치킨을 먹을 때 이 부분에 살이 붙어 있다는 걸 기억할 것이다).
전피막은 날개를 접었다 펼 수 있게 해주며, 날개가 공기에 닿는 면적을 늘려 비행을 돕는다. 그래서 새 중에서도 펭귄이나 타조 등 날지 않는 새들의 경우, 전피막이 퇴화된 걸 볼 수 있다. 그만큼 새의 비행과 전피막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전피막이 언제부터 출현했는지 알아낸다면, 공룡이 날기 위한 퍼덕임을 시작한 시점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전피막은 연조직으로 이뤄져, 화석으로 쉽게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연구팀은 꾀를 하나 냈다. 사람은 전피막이 없다. 그래서 팔을 곧게 펼 수 있다. 하지만 전피막이 있는 새는 절대로 팔을 온전히 펼 수 없다. 이 제한은 화석에도 남는다. 화석에서 팔을 유독 구부리고 있는 공룡은 전피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연구팀은 확실히 전피막을 갖고 있지 않은 악어 등 이궁류 화석 71개의 평균 팔꿈치 각도와, 확실히 전피막을 갖고 있는 대형 조류 화석 35개의 평균 팔꿈치 각도를 측정했다. 이궁류 화석에서 137.9도, 대형 조류 화석에서 31.3도였던 평균 각도를 토대로 전피막을 가진 공룡의 화석이라면, 팔꿈치 각도가 110도 이하일 거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었다. 이 기준을 토대로 기존에 발견된 공룡 화석의 평균 팔꿈치 각도를 분석한 결과, 지금으로부터 1억 6500년 전부터 나타난 마니랍토라 계통군의 공룡이 공통적으로 전피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마니랍토라 계통군이 출현했을 때부터 날개를 퍼덕여 비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전피막은 어떻게 활용됐기에, 전피막이 날개가 됐을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공룡의 어설픈 첫 날갯짓을 찾았다고 할 수 있겠다.


시조새의 날갯짓을 분석하다

진화 시계를 되돌려 닭을 공룡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연구원의 말처럼, 새와 공룡의 구분은 칼 자르듯이 명확히 할 수는 없다. 어제까지 날지 못했던 새가 하루 아침에 하늘을 지배했을 리도 없다. 최후의 공룡은 아주 천천히 진화했을 것이다. 2020년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에는 새의 비행이 크게 세 번 독립적으로 진화했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doi: 10.1016/j.cub.2020.06.105 우리가 아는 새가 출현하기 전부터, 수각류 공룡은 날개를 퍼덕이며 경사를 오를 때 추진력을 얻으려 노력했을 것이다. 어떤 공룡은 달릴 때 날개짓을 해 속도를 높이거나, 꽤나 먼 거리를 폴짝 뛰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새의 탄생 뒤에는 다양한 진화적 실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 과정을 떠올려 보면 꽤나 즐겁다. 오늘날 새의 비행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공룡의 퍼덕거림을 본다면, 어설프다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생대 공룡의 어설픈 날개짓 덕에 오늘날 새가 있었음을 떠올려보면, 마냥 무시할 수도 없겠다.
기사를 마치며, 기자가 가장 좋아하는 새의 진화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새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공룡이라는 점에 착안해, 거꾸로 새를 연구해 과거 공룡의 보행을 복원한 연구다. 2014년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발표됐다. 말이 어렵지, 병아리 뒤꽁무니에 뚫어뻥처럼 생긴 인공 꼬리를 붙여,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수각류가 묵직한 꼬리를 달고 걸었던 모습을 구현한 것이다. 영상이 재미있으니 꼭 보시길.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