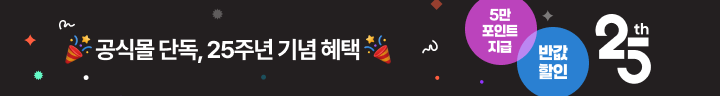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 과학에는 그런 분야가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천체사진은 유독 ‘깊다’. 겉보기엔 단순히 밤하늘을 촬영한 것처럼 보이나, 파고들수록 장비의 끝도, 해석의 끝도, 표현의 끝도 없다. 마치 우주의 심연처럼.
이런 천체사진에 빠지게 되는 계기는 사진가마다 다르다. 하지만 그들에겐 하나의 공통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좋은 걸, 당신도 좀 봤으면 해.”
그 바람이 독자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며 화보를 펼친다. 별이 춤추고, 성운이 피며, 우주의 먼지가 밤하늘을 수놓는 찰나의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자.

작은 렌즈로 담아낸 캘리포니아 성운
지용호 I 심우주 부문 금상
2024년 12월, 충주 앙성면에서 자체 개발한 초소형 원격 천문대로 18일간 촬영한 캘리포니아 성운(NGC 1499)이다. 페르세우스자리에 위치한 대표적인 발광 성운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닮은 모양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작가는 구경 51mm, 초점거리 250mm의 소형 망원경을 개조해 성운의 다채로운 색감과 주변의 신비로운 우주 먼지를 한 장에 담았다. 작은 렌즈로도 광활한 우주를 포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작품이다.

우주거품
방지영 I 심우주 부문 동상
우주에 떠 있는 거대한 거품, 거품 성운(NGC 7635)을 촬영한 이미지다. 투명한 비누방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복사선과 초고온의 가스가 가득 차 있다. 성운 중심에는 매우 뜨겁고 무거운 별이 있다. 이 별이 뿜어내는 강한 항성풍이 주변의 성간물질을 밀어내며 우주 공간에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냈다.

NGC 7331과 외로운 은하들의 춤
송재훈 I 대상
페가수스자리에 위치한 나선은하 NGC 7331과 그 주변에 보이는 동반 은하들을 한 장에 담았다. 마치 아이돌과 그를 둘러싼 댄서 그룹을 보는 듯한 구도다. 화면 뒤편에 자리한 작은 은하들은 겉보기엔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NGC 7331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작가는 이들이 함께 춤을 추는 듯한 장면을 통해, 우주의 깊이와 스케일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봄날의 산책
이상희 I 최우수상
세페우스자리에 위치한 거대한 발광 성운(IC 1396)의 일부를 담았다. 언뜻 보면 코끼리의 코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법사 간달프의 지팡이를 닮은 듯도 하다. 이처럼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 천체사진의 또 다른 매력이다. 작가는 이 장면에서 따스한 봄날 오솔길을 걷는 여인의 애틋한 뒷모습을 떠올렸다.

유성우의 밤
조은옥 I 지구와우주 부문 동상
2024년 8월 12일 밤,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약 한 시간 동안 밤하늘을 수놓던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작가는 경남 합천군과 산청군 사이에 위치한 황매산 정상에서 쏟아지는 유성우를 카메라에 담았다. 은하수의 꼬리가 마치 착륙 지점을 가리키기라도 하듯, 그 방향으로 유성우가 떨어지는 풍경이 인상적이다.

Double Arch
최인호 I 지구와우주 부문 은상
수억 년 침식으로 형성된 거대한 퇴적암의 자연 아치 ‘네이처스 윈도우’와, 은하수의 아치가 마주보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네이처스 윈도우’는 오스트레일리아 서호주 칼바리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지형으로, 마치 자연이 만든 액자처럼 보인다. 작가는 이 액자 속에 은하수가 흐르는 순간을 담아냈다.

찍-찍, 찌-익 우주 그래피티
강재명 I 심우주 부문 동상
헤라클레스자리의 대형 구상성단, 헤라클레스대성단(M13)에는 수십만 개의 별이 조밀하게 모여 있다. 작가는 이 장면을 우주라는 검은 도화지에 스프레이로 뿌려낸 그래피티처럼 바라봤다. 멀리서 가볍게 ‘찍-찍’, 가까이 다가가 중심부에 ‘찌-익’ 하고 별빛을 뿌려 넣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상상해보자. 작가는 예술적 표현을 더하기 위해, 별 주변에 십자 모양의 빛갈라짐(스파이더 상)이 생기도록 망원경 렌즈에 특수 제작한 마스크를 부착했다.

태양계를 스쳐간 빛
이성모 I 태양계 부문 금상
2024년 10월 중순, 쯔진산-아틀라스 혜성(C/2023 A3)이 지구에 약 7100만 km까지 접근했다. 주기가 약 8300만 년에 이르는, 언제 다시 지구를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귀한 손님이 당시에는 서쪽 하늘에서 맨눈으로도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밝았다.
작가는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성의 궤적을 따라 부드럽게 휘어지는 먼지꼬리와 태양 반대 방향으로 곧게 뻗은 이온꼬리를 정확히 포착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혜성을 본 소중한 순간”이라고 작가는 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