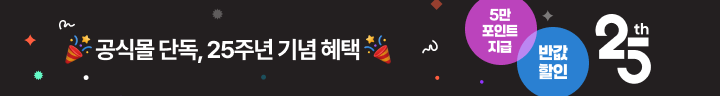지구에서 1억 5000만 km 떨어진 거대하고 뜨거운 불덩이, 태양. 이게 뭐라고 전 인류가 그 움직임을 기준으로 날짜와 시간을 세게 된 걸까요. 2024년의 끝을 맞이해 조금 촉촉해진 감성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태양의 정체를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수만 년 전 인류에게 태양은, 초자연적인 요소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대상이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저것은 횃불보다도 훨씬 밝단 말이죠.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것도, 계속해서 뜨고 지는 것도 이상하고요.
인류가 주변의 자연현상을 지각한 이후부터, 태양의 미스터리를 푸는 건 어떤 본능이었을 겁니다. 태양은 그 자체로도 신기할 뿐 아니라 날씨와 계절을 좌지우지하니 먹고 살기 위해선 태양을 알아야 했겠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선 태양력을 만들어 시간을 셌고, 기원전 6세기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태양이 지나는 궤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태양은 신화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16세기 아이작 뉴턴은 태양의 움직임을 수학으로 풀어냈고, 19세기 프리드리히 베셀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쟀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접어들자 과학자들은 태양, 그리고 별의 탄생과 죽음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은 우주 공간의 기체와 먼지가 뭉쳐 탄생합니다. 이를 성간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성간물질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만유인력에 의해 성간물질이 서로 뭉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간물질이 뭉친 중심의 온도가 높아지면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고 별이 탄생하는 것이죠.
별이 태어나는 과정은 대체로 같습니다. 하지만 별의 죽음은 다양합니다. 어떤 별은 블랙홀이 되고, 어떤 별은 초신성이, 또는 백색왜성이나 갈색왜성이 되죠. 다양한 별의 운명을 구분한 이는 인도 출신 천체물리학자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였습니다. 그는 질량이 작은 별의 후기 형태인 백색왜성이 한계 질량 이상으로 무거우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고 그것보다 가볍다면 백색왜성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찬드라세카르 한계’ 이론을 발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찬드라세카르가 내놓은 이론에 따르면 태양은 백색왜성으로 남아 조용히 식어갈 겁니다.
태양, 그리고 별을 이해하는 천문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문이자 가장 최첨단을 달리는 학문입니다. 탈레스와 뉴턴, 그리고 찬드라세카르에 이어 별의 비밀을 밝힐 다음 주자가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틀린 문제가 많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의 물리학을 아주 쉽게 정리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과학 수업 별의 물리학’이 있으니까요. 이 책은 천체물리학의 획을 그은 학자들의 연구를 역사와 사진, 수식을 통해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찬드라세카르가 198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끈 논문도 수록돼 있는데요. 천문학자를 꿈꾸는 독자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수상대성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