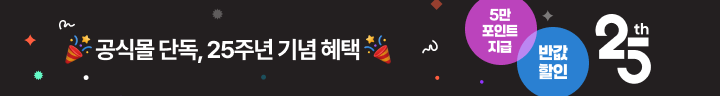습한 더위가 몰려오기 시작한 날, 경기도 고양시 안곡습지공원에 지구사랑탐사대 13기 대원들이 모였어요. 평범한 동네 공원에서 지사탐 대원들은 어떤 생물을 만났을까요?
알에서 여왕까지, 개미의 한살이
“개미는 온도 변화에 민감한 생물이에요.”
지난 5월 31일, 수풀이 가득한 안곡습지공원을 가로지르며 지구사랑탐사대 이디엘 연구원이 대원들에게 말했어요. 개미는 종마다 다르지만 주로 18~27℃ 사이의 온도를 선호해요. 온도가 이보다 더 높거나 낮으면 번식과 먹이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죠. 특히 도시에서는 건물이나 도로가 빽빽하게 들어서면서 기온이 높아져 개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대원들은 몇 걸음을 채 떼기도 전에 개미를 발견했어요. 발견한 개미를 반투명한 통에 담으면, 이디엘 연구원이 어떤 종의 개미인지 설명해 줬어요. 개미는 전 세계에 약 1만 4000여 종 이상 분포할 것으로 추정돼요. 우리나라에는 일상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곰개미를 비롯해 약 170종의 개미가 살고 있죠. 종마다 외모와 특성도 모두 달라요.
이날 대원들은 고동털개미, 곰개미 등 10종이 넘는 개미를 만났어요. 종도 다양하고, 성장 상태도 각기 달랐죠. 이디엘 연구원이 썩은 나무뿌리 껍질을 살짝 걷어내자, 알과 번데기를 물고 이동하던 개미들이 나타났어요.
개미는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총 4가지 단계를 거쳐요. 이러한 발달 형태를 ‘완전탈바꿈’이라고 해요. 애벌레와 성충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보통 6월에는 여왕개미와 수개미들이 번식하기 위해 ‘결혼 비행’을 합니다. 이디엘 연구원은 “갓 태어난 여왕개미가 쉽게 땅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일개미들이 여왕개미 번데기를 땅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놓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개미의 이웃, 진딧물과 흰개미
“이건 개미가 아닌데, 뭐예요?”
한 대원이 몸에 줄무늬가 있는 작은 곤충을 집어 들며 물었어요. 이디엘 연구원은 “개미가 먹이로 가져온 꽃등에”라고 설명했어요. 개미는 잡식성 생물로, 씨앗이나 과일뿐만 아니라 죽은 곤충이나 동물 등도 먹어요. 일부 개미 종은 진딧물 등의 작은 생물을 천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대신 진딧물의 꽁무니에서 나오는 단물을 마시기도 해요. 마치 농장을 운영하듯, 개미굴 안쪽이나 특정한 구역에 진딧물을 모아놓고 돌보면서 단물을 꾸준히 얻는 개미들도 있답니다.
대원들이 나무가 울창한 구역으로 들어서자,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가 많이 나타났어요. 흰개미는 주로 죽은 나무와 낙엽을 먹이로 삼아요. 나무와 낙엽에 남은 흰개미의 흔적을 보면 쉽게 찾아낼 수 있죠. 이름에는 개미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사실 흰개미는 개미와는 다른 종이에요. 개미보다는 바퀴벌레와 더 가까운 생물이죠. 흰개미는 그냥 나무뿐만 아니라 나무로 된 가구나 건물의 기둥 등도 갉아먹어서 사람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기도 해요. 우리나라 산림청은 흰개미를 해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공원 곳곳을 돌며 개미들을 관찰하고 모은 뒤, 대원들은 마지막으로 확대경을 통해 발견한 개미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일본침개미의 얼굴이 크게 나오자 대원들은 화면 가까이로 모여들었어요. 이디엘 연구원은 “일본침개미는 독침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 건드리면 쏘일 수도 있다”며 “벌에 쏘인 것만큼이나 아프다”고 설명했어요.
시민과학자들이 집 주변의 개미들의 생태를 꾸준히 관찰하면, 도심 속 개미들이 도시의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온도 변화에 민감한 개미가 어떤 방식으로 아스팔트 빌딩에서의 삶에 적응했는지, 서식지는 어디서 어디로 옮기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죠. 흰별나비 팀 김규빈 대원은 “새를 관찰할 때는 하늘을 보면서 사진을 찍느라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개미는 땅에 사는 만큼 좀 더 쉽고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