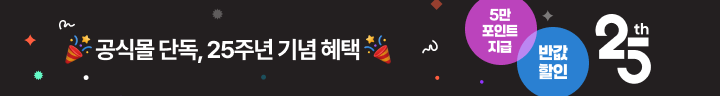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 만들다
인공태양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인 ‘핵융합’을 지구에서 구현한 기술이에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2007년 우리나라의 인공태양 ‘KSTAR(케이스타)’를 만들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어린이 기자단은 대전에 있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찾아 미래 에너지를 탐험했어요.
핵융합의 재료는 수소예요. 수소는 중심에 있는 원자핵의 구성에 따라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로 나뉩니다. 수소의 원자핵은 양성자 1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중수소의 원자핵은 양성자 1개에 중성자 1개가, 삼중수소의 원자핵은 양성자 1개에 중성자 2개가 달라붙은 형태이지요.
핵융합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선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합쳐야 해요. 이 과정에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과 중성자 1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헬륨과 중성자를 합친 질량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합친 질량보다 작아요. 따라서 질량이 차이나는 만큼 에너지가 방출돼요. 이 에너지가 바로 핵융합에너지랍니다.
핵융합의 연료인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어 부족할 걱정이 없어요. 지구를 뜨겁게 하는 온실가스도 전혀 배출하지 않지요. 그래서 실제 태양처럼 오랫동안 깨끗하게 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이 인공태양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린이 기자단은 핵융합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실험에 참가했어요. 우선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상징하는 두 개의 작은 상자에 돌을 가득 담았어요. 그다음 두 상자에 담긴 돌을 헬륨을 상징하는 하나의 큰 상자에 옮겼어요. 그러자 두 상자에 담긴 돌 중 일부가 큰 상자 안에 담기지 못하고 바깥으로 빠져나왔죠. 고진석 박사는 “바닥으로 흘러 나온 돌들이 바로 핵융합에너지”라고 설명했어요.




핵융합의 비결,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하라
실험이 끝난 후, 어린이 기자단은 KSTAR를 둘러보았어요. KSTAR의 크기는 지름 9.4m, 높이 9.6m, 무게 약 1000t(톤)으로 매우 거대하지요. KSTAR를 구석구석 살피던 어린이 기자단의 눈에 거대한 도넛 모양의 용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용기는 KSTAR처럼 도넛 모양 장치 안에 플라즈마 상태의 연료를 가두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장치인 ‘토카막’이에요. 고체가 열을 받으면 액체, 액체가 열을 받으면 기체가 돼요. 그리고 기체가 열을 받으면 물질의 네 번째 상태인 플라즈마가 됩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태양도 플라즈마 상태랍니다.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플라즈마의 온도가 1억 ℃ 이상까지 올라가야 해요. 매우 뜨겁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플라즈마를 담으려면 도넛 모양의 특수한 용기인 토카막이 필요하답니다. 토카막에는 수십 개의 자석이 들어 있어요. 따라서 토카막 주위에는 자석의 힘이 작용하는 공간인 자기장이 형성돼요. 자기장이 플라즈마를 토카막 안에 가두면, 플라즈마는 토카막 안을 끊임없이 돌며 핵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KSTAR 장치 내부를 들여다 본 김도윤 어린이 기자는 “핵융합 장치 내부가 무척 깨끗하다”고 설명했어요. 이어 “도넛 모양 용기 안을 빙글빙글 돌아다니면 재밌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어린이 기자단은 자기장의 힘을 체감할 수 있는 ‘마녀 빗자루 띄우기’ 활동에 참여했어요. 어린이 기자단은 빗자루 모형과 바닥 판에 각각 자석을 끼웠어요. 이때 빗자루와 바닥에 둔 자석이 같은 극끼리 마주보도록 놓았어요. 그래야 서로 밀어내는 힘인 반발력이 작용해 빗자루가 뜨거든요. 임연정 어린이 기자는 “빗자루를 띄우는 활동을 통해 토카막이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띄우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KSTAR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요? 고진석 박사는 “오는 10월부터 KSTAR의 성능이 향상됐는지 확인할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실험에 앞서 토카막의 입구를 닫고 기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기체를 없앤 뒤, 플라즈마를 가둘 강력한 자기장을 유지하기 위해 토카막 온도를 영하 270℃까지 낮출 예정이에요.
그동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1억 ℃에 달하는 플라즈마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실험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10월 실험부터는 플라즈마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걸 넘어, KSTAR의 핵융합 능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고진석 박사는 “KSTAR의 성능에 관한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 대표값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어 “대표값의 수치를 높이는 게 이번 실험의 목표”라고 전했어요.
박연아 어린이 기자는 “앞으로 진행할 KSTAR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 전 세계에 도움이 될 청정에너지를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KSTAR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